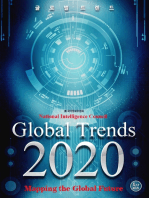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2014 세계경제 전망 PHẦN 2
2014 세계경제 전망 PHẦN 2
Uploaded by
Đỗ Hoài Thương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2 views3 pages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2 views3 pages2014 세계경제 전망 PHẦN 2
2014 세계경제 전망 PHẦN 2
Uploaded by
Đỗ Hoài Thương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You are on page 1of 3
[ 2 trang sau ]
◆ 中 리스크 대비해 한국정부·기업 안전판 강화해야
임 희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편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2014 년에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중국의
중간재·자본재·원자재 등 세부 품목 변화까지 주시해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양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중 교역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면 국내 여행업계의 ‘차이나효과’가 감소한다. 국내 증권시장에 들어온
중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전문가 다수는 중국발 위기에 대한 상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전기기기·자동차·석유화학 등 대중 수출 감소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해외진출 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러시아·중앙아시아·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에게는 중국발 위기에 대비한 비상경영(컨틴전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지역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현금경영강화 등
위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명 연구원은 “중국 구조개혁은 1997
년 한국 외환위기 때처럼 급속한 것은 아니다. 부실 기업이 도산할 수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기가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지만 한국 수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정부는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 안전판을 강화하고 시장의
유동성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현지
국내기업이 자금 경색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금조달 지원책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 주요기업 “대규모 투자와 현지 맞춤형 전략 이어간다”
삼 성은 1992 년 중국에 진출했다. 한·중 수교가 시작된 해다. 중국삼성 매출은
삼성그룹 총매출의 20%를 차지한다. 박재순 삼성전자 중국 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16 일 한·중 교류포럼에서 “중국은 2015 년 세계 1 위 소비시장이 될 것이다”며 “
중국 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 본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삼성은 내년 4 개 사업군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삼성의 핵심
사업분야는 금융·건설·정보기술(IT)·의료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기존
기술분야 투자도 함께 늘린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은 중국 정부의 7 대 개혁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중국 서부·중부·북동 지역 투자를 늘려 중앙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2002 년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중국 내 3 위 업체로 올라섰다. 현대·기아차의 비약적
성장은 ‘현대속도’라는 현지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내 년 현대·기아차는 물량 확대와 현지 맞춤형 모델 출시로 오름세를 잇는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중국 현지 공장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지난해 40
만대 양산 가능한 3 공장을 건설했다. 내년 1 월 3 공장은 45 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기아차 중국 3 공장까지 가동되면 현대·기아차는 179 만대
규모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동차 시장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중국 국가정보센터(SIC)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판매 성장률은 2006~2010 년 연평균 28%대였지만, 2011~2015 년 12%대, 2016~2021
년 7%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내년에도 생산물량를 늘릴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생산물량 확대와 현지 맞춤형 모델 출시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94
년 중국 옌타이에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세우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2000 년대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며 혜택을 입었다. 2008 년 말
휠로더 생산공장을 짓고 2011 년 제 2 굴삭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 확장을 했다.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이 긴축 국면에 접어들며 고전하는 모습이다.
중국 건설중장비 시장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내년
실적이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석원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에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You might also like
- (국제경제리뷰) 중국의첨단산업발전현황및주요과제 fDocument26 pages(국제경제리뷰) 중국의첨단산업발전현황및주요과제 fyunNo ratings yet
- 23데이터인사이트 인도네시아유망품목군수출확대전략Document74 pages23데이터인사이트 인도네시아유망품목군수출확대전략서종환No ratings yet
- 2018 중동 진출전략 PDFDocument74 pages2018 중동 진출전략 PDFldw40070764No ratings yet
-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Document13 pages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sunNo ratings yet
- Small Company But Great CEOsDocument25 pagesSmall Company But Great CEOsBrandon Meg ShinNo ratings yet
- KERI Insight 21-12Document26 pagesKERI Insight 21-12fuiopNo ratings yet
- (20230102) 새해 민간투자시장 포문 여는 대장홍대선…현대건설 무혈입성하나Document3 pages(20230102) 새해 민간투자시장 포문 여는 대장홍대선…현대건설 무혈입성하나박찬식No ratings yet
- 보험정책 - 금융위원회Document14 pages보험정책 - 금융위원회peterNo ratings yet
- 스마트팩토리 해외동향 (final)Document18 pages스마트팩토리 해외동향 (final)Rancho NohNo ratings yet
- 보도자료_중기부Document10 pages보도자료_중기부SungJun ParkNo ratings yet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해외 선진은행의 인적자원관리 사례 분석과 시사점Document20 pages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해외 선진은행의 인적자원관리 사례 분석과 시사점LaLa HaNo ratings yet
- 박근형의 데일리힌트 - 231013 - 497Document14 pages박근형의 데일리힌트 - 231013 - 497장경욱No ratings yet
- Insight Report 2019-06Document73 pagesInsight Report 2019-06jonbdNo ratings yet
- 230420 (보도자료)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Document4 pages230420 (보도자료)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TALENo ratings yet
- 중소제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현성테크노Document15 pages중소제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현성테크노Adil KhanNo ratings yet
- TF18호. 기업 R&D 현황 분석 및 투자 활성화 방안Document46 pagesTF18호. 기업 R&D 현황 분석 및 투자 활성화 방안Giroro TzangNo ratings yet
- 2015년 ICT 10대주목 전망Document73 pages2015년 ICT 10대주목 전망jeric kimNo ratings yet
- KOTRA 자료 22-047Document564 pagesKOTRA 자료 22-047choiNo ratings yet
- 20190320155305792123010Document13 pages20190320155305792123010Khánh Ngọc NguyễnNo ratings yet
- 박근형의 데일리힌트 - 231017 - 748Document16 pages박근형의 데일리힌트 - 231017 - 748장경욱No ratings yet
- Script 2Document6 pagesScript 2jvcrsghfzrNo ratings yet
- 거대한 나라 인도 (INDIA)Document8 pages거대한 나라 인도 (INDIA)Manish Kumar BarnwalNo ratings yet
- 2020-2030 TMR 세계시장동향보고서 통합본Document61 pages2020-2030 TMR 세계시장동향보고서 통합본Seokjun ParkNo ratings yet
- (참고자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Document32 pages(참고자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Sara ChoiNo ratings yet
- (20230106) (2023 공공건설시장 전망) 토목 7.7조ㆍ건축 4.5조 발주… 해수부ㆍ철도공단ㆍ지자체가 ‘견인'Document3 pages(20230106) (2023 공공건설시장 전망) 토목 7.7조ㆍ건축 4.5조 발주… 해수부ㆍ철도공단ㆍ지자체가 ‘견인'박찬식No ratings yet
- 5강 심화자료 1. 광고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AI) 활용 전략 PDFDocument15 pages5강 심화자료 1. 광고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AI) 활용 전략 PDF채현민No ratings yet
- 191111 (산업동향 Vol. 1) 최근 자동차 생산·수출 동향 및 전망Document1 page191111 (산업동향 Vol. 1) 최근 자동차 생산·수출 동향 및 전망vlwk26No ratings yet
- 172018년수출전망및지역별시장여건Document41 pages172018년수출전망및지역별시장여건MangoNo ratings yet
-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Document30 pages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peterNo ratings yet
- 언어와 매체 수행평가-1Document2 pages언어와 매체 수행평가-1gochawon8634No ratings yet
- 언어와 매체 수행평가Document2 pages언어와 매체 수행평가gochawon8634No ratings yet
- 건설동향브리핑 928호Document12 pages건설동향브리핑 928호Ray LeeNo ratings yet
- 경제동향 보고 (인도) - 2021 - 상반기 - 최종 (외부)Document7 pages경제동향 보고 (인도) - 2021 - 상반기 - 최종 (외부)김현진No ratings yet
- OTKCMA211016Document201 pagesOTKCMA211016nick kimNo ratings yet
- 중국 헝다 그룹Document15 pages중국 헝다 그룹jvcrsghfzrNo ratings yet
- ÄÚ º ÞÆ ®Æ÷Æ® 385È (11¿ù Ñ°ÁÖ)Document34 pagesÄÚ º ÞÆ ®Æ÷Æ® 385È (11¿ù Ñ°ÁÖ)ennuvijaykumarNo ratings yet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 보고서Document45 pages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 보고서23ugaugaNo ratings yet
- STEPI Insight 298 PDFDocument47 pagesSTEPI Insight 298 PDF李修瑩No ratings yet
- 찌라시 (20070514) 1Document10 pages찌라시 (20070514) 1api-3805754No ratings yet
- 20110420074138ſ 1Document89 pages20110420074138ſ 1이재설No ratings yet
- Pr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Document166 pagesPr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Helen LeeNo ratings yet
- 2022년 제2기 - 서류함 실행과제 3Document12 pages2022년 제2기 - 서류함 실행과제 3dongkyun ryuNo ratings yet
- 동남아의 중심, 태국Document27 pages동남아의 중심, 태국ana fláviaNo ratings yet
- (보도참고자료) 220517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소상공인손실보상과)Document3 pages(보도참고자료) 220517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소상공인손실보상과)In Geun JungNo ratings yet
- (보도참고자료) 220530 중기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기획재정담당관실 등)Document5 pages(보도참고자료) 220530 중기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기획재정담당관실 등)In Geun JungNo ratings ye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alysi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On Technology-Based StartupsDocument15 pages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alysi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On Technology-Based StartupsdiepthienthaoNo ratings yet
- 201701544 김수연 콜라주 12주차Document2 pages201701544 김수연 콜라주 12주차김수연No ratings yet
- 2021 IT 전망보고서 - IDG Deep Dive - 20201222 - v2Document55 pages2021 IT 전망보고서 - IDG Deep Dive - 20201222 - v2young gyoo shinNo ratings yet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투자전략과 손정의의 비전Document3 pages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투자전략과 손정의의 비전Hanui KimNo ratings yet
-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1) 일본의 인공지능 (AI) 정책 동향과 실행전략Document26 pages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1) 일본의 인공지능 (AI) 정책 동향과 실행전략수경No ratings yet
- TB 06.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해외 진출 사례Document8 pagesTB 06.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해외 진출 사례성빈No ratings yet
- 2024인도네시아진출전략Document106 pages2024인도네시아진출전략서종환No ratings yet
- Ai (Id) - 231109Document3 pagesAi (Id) - 231109taylorahnNo ratings yet
- 세계 금속 표면처리 Metal Finishing 시장 분석 및 예측Document19 pages세계 금속 표면처리 Metal Finishing 시장 분석 및 예측taekyoonNo ratings yet
- KISTEP+Issue+Weekly+2018-34 (Vol 252)Document35 pagesKISTEP+Issue+Weekly+2018-34 (Vol 252)한서현No ratings yet
- 701Document334 pages701tyler10q2002No ratings yet
- 2024 ICT 혁신 트렌드Document5 pages2024 ICT 혁신 트렌드Minho SoNo ratings yet
- 참자1Document18 pages참자1zzsimba0829No rating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