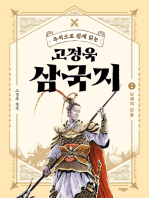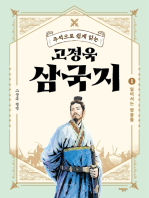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08.농무, 신선재곤이
08.농무, 신선재곤이
Uploaded by
한율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16 views2 pages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16 views2 pages08.농무, 신선재곤이
08.농무, 신선재곤이
Uploaded by
한율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DOCX,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You are on page 1of 2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룟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신선 재곤이
서정주
땅 우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앉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마는,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었습니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치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의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 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무거운 모습만이 산 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神仙道)에도 약간 알음이 있다는 좋은 흰 수염의 조 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천 년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여……”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맷돌을 단단히 매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 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사 옳다”고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치위: 추위.
You might also like
- EBS 현대시 100선 - 가로Document105 pagesEBS 현대시 100선 - 가로popee49No ratings yet
- 무녀도Document11 pages무녀도dhaniya87No ratings yet
- 불을 다루는 사람들Document576 pages불을 다루는 사람들Александр Логинов100% (1)
- 옥단춘전Document20 pages옥단춘전임지선No ratings yet
- (작품별) 2022 신경림 - 농무 (01) (31문제) (1) - 복사본Document12 pages(작품별) 2022 신경림 - 농무 (01) (31문제) (1) - 복사본soo6mungNo ratings yet
- Arirang Vol 01Document221 pagesArirang Vol 01logosfinderNo ratings yet
- Ebs 현대시 100선 - 복사본Document103 pagesEbs 현대시 100선 - 복사본siwookl07No ratings yet
- 2Document496 pages2Александр ЛогиновNo ratings yet
- Korean Poems by Paik SokDocument8 pagesKorean Poems by Paik Sok김달진No ratings yet
- Jeseseongjon - Jegalceon - UnknownDocument282 pagesJeseseongjon - Jegalceon - UnknownJongNo ratings yet
- 무녀도Document11 pages무녀도dhaniya87No ratings yet
- (2024년 기출변형) 다정고등학교 (세종 전체) 1-1 중간 국어 족보 (신사고 (민현식) ) (Q) 1회Document16 pages(2024년 기출변형) 다정고등학교 (세종 전체) 1-1 중간 국어 족보 (신사고 (민현식) ) (Q) 1회y2un.t1130No ratings yet
- 채만식 논 이야기전문Document11 pages채만식 논 이야기전문gimbada4633No ratings yet
- 미스터 방Document8 pages미스터 방bagminyoung00No ratings yet
- 수난이대Document6 pages수난이대dhaniya87No ratings yet
- 동백꽃 김유정 핵심정리+핵심문제Document22 pages동백꽃 김유정 핵심정리+핵심문제Yoonseo ChoiNo ratings yet
- Widow's CruseDocument4 pagesWidow's Crusekingsarmy.shinyungNo ratings yet
- 꼭 알아야 할 현대시 50편Document27 pages꼭 알아야 할 현대시 50편하느님No ratings yet
- (2018년 기출) 국어 고전소설 문제 모음 (3학년 3,4,7,10월 학평, 6,9월 모의평가) PDFDocument10 pages(2018년 기출) 국어 고전소설 문제 모음 (3학년 3,4,7,10월 학평, 6,9월 모의평가) PDFNyan KyiNo ratings yet
- (2018년 기출) 국어 고전소설 문제 모음 (3학년 3,4,7,10월 학평, 6,9월 모의평가) PDFDocument10 pages(2018년 기출) 국어 고전소설 문제 모음 (3학년 3,4,7,10월 학평, 6,9월 모의평가) PDFNyan KyiNo ratings yet
- 도요새에 관한 명상 전문Document25 pages도요새에 관한 명상 전문qtjcttg99zNo ratings yet
- (2022년 예상) 송원고등학교 (광주 남구) 2-1 기말 문학 족보 (미래엔 (방민호) ) (Q) 2회Document19 pages(2022년 예상) 송원고등학교 (광주 남구) 2-1 기말 문학 족보 (미래엔 (방민호) ) (Q) 2회mrm045863No ratings yet
- 박지원 양반전Document3 pages박지원 양반전곽수진No ratings yet
- 사하촌Document14 pages사하촌dhaniya87No ratings yet
- ( ) +6 - (2) +2 HWPDocument3 pages( ) +6 - (2) +2 HWPmfrjjnymdqNo ratings yet
- 루치안 블라가-이교의 신비Document83 pages루치안 블라가-이교의 신비zalomxisNo ratings yet
-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Document32 pages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students099026No ratings yet
- 이도다이어리 (연재 10회)Document2 pages이도다이어리 (연재 10회)MinSoon ParkNo ratings yet
- 성황당Document12 pages성황당dhaniya87No ratings yet
- 황만근은이렇게말했다Document11 pages황만근은이렇게말했다Eon-Suk KoNo ratings yet
- 문학 서술형평가 4 (1) 고대문학 문제 미래엔.hwp unlockedDocument2 pages문학 서술형평가 4 (1) 고대문학 문제 미래엔.hwp unlocked승혁No ratings yet
- (나비효과 입문편) 40강 제압 문제Document2 pages(나비효과 입문편) 40강 제압 문제Hyojun ParkNo ratings yet
- 25 수특 문학 적용 현대소설 02 만무방 분기Document17 pages25 수특 문학 적용 현대소설 02 만무방 분기1510변수연No ratings yet
- Kim Ngao Tân Tho IDocument49 pagesKim Ngao Tân Tho IThúy Nga - 티나No ratings yet
- 2022 2-2.삶을 말하는 문학 (01) - 비상 (김진수) 3-2 (프리미엄) 국어 3학년 2학기 중간 (26문제) (Q)Document11 pages2022 2-2.삶을 말하는 문학 (01) - 비상 (김진수) 3-2 (프리미엄) 국어 3학년 2학기 중간 (26문제) (Q)안승민No ratings yet
- 흥부전Document12 pages흥부전임지선No ratings yet
- 김유정 만무방 조선일보Document17 pages김유정 만무방 조선일보a01071478039No ratings yet
- (2022년 예상) 송원고등학교 (광주 남구) 2-1 기말 문학 족보 (미래엔 (방민호) ) (Q) 3회Document17 pages(2022년 예상) 송원고등학교 (광주 남구) 2-1 기말 문학 족보 (미래엔 (방민호) ) (Q) 3회mrm045863No ratings yet
- I410 Ecn 0199 2018 001 000747407Document10 pagesI410 Ecn 0199 2018 001 000747407이지나No ratings yet
- ( ) +6 - (2) +1 HWPDocument3 pages( ) +6 - (2) +1 HWPmfrjjnymdqNo ratings yet
- 춘향전Document47 pages춘향전임지선No ratings yet
- 관동별곡전문 해석 누Document8 pages관동별곡전문 해석 누공부해라건우No ratings yet
- 복덕방Document9 pages복덕방bagminyoung00No ratings yet
- 이효석 - 메밀꽃 필 무렵Document10 pages이효석 - 메밀꽃 필 무렵seoms1025No ratings yet
- (이순정) 짐승 2권 (완결)Document173 pages(이순정) 짐승 2권 (완결)melanimastrapaleyvaNo ratings yet
- 배따라기Document7 pages배따라기dhaniya87No ratings yet
- 6Document6 pages6psycopomp13245768No ratings yet
- ( ) 2 - (2) 2Document8 pages( ) 2 - (2) 2helloNo ratings yet
- 이인직 (1906) 혈의누Document69 pages이인직 (1906) 혈의누Sara OctavianiNo ratings yet
- (족보닷컴 미리보는 기말고사) 고2 문학 비상 (한철우)Document15 pages(족보닷컴 미리보는 기말고사) 고2 문학 비상 (한철우)20316김민정No ratings yet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Document14 pages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yes20221124No ratings yet
- 머신러닝의 알고리즘Document3 pages머신러닝의 알고리즘한율No ratings yet
- 딥러닝Document3 pages딥러닝한율No ratings yet
- 10.다시 봄이 왔다,성에꽃Document2 pages10.다시 봄이 왔다,성에꽃한율No ratings yet
- 국어 정리Document5 pages국어 정리한율No rating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