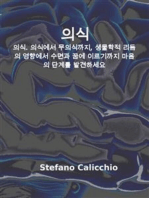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Beyond Human Genome Project - 2021311575 김서인 PDF
Beyond Human Genome Project - 2021311575 김서인 PDF
Uploaded by
김서인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12 views2 pagesOriginal Title
Beyond Human Genome Project_2021311575 김서인.pdf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12 views2 pagesBeyond Human Genome Project - 2021311575 김서인 PDF
Beyond Human Genome Project - 2021311575 김서인 PDF
Uploaded by
김서인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You are on page 1of 2
2003년 HGP의 결과 발표 이후 최근까지도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완전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이유는 무엇이며, HGP 이후 완전한 유전체 해독을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 GRC (Genome Reference Consortium)와 T2T (Telommere-to-Telomere)
consortium은 어떤 단체이며 이들이 유전체 해독에 기여한 바는? 그리고 이 업적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는 2003년까지 인간 유전체에 있는
약 32억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중국 6개국의 공동 노력과 Celera
Genomics라는 민간 법인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효모와 선충류 등을 포함한 다른 종의 유전체 서열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것에서 더욱 복잡한 인간 지놈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결과는 의학과 과학 분야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이 결과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염색체 상에서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HGP를 통해 인간 유전자 지도가 나온 지 거의 20년 만에 기능이 불분명한 '정크DNA'로
남겨졌던 나머지 8%도 모두 해독한 것으로 발표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HGRI)가 중심이 된 Genome Reference Consortium(GRC)인
'텔로미어-투-텔로미어'(T2T)는 HGP 유전체 지도에서 빠진 부분을 해독해 최초로 완전한
유전체를 완성했다고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밝혔다. GRC는 인간 유전체
서열을 개선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염기서열을 추가하여 기본 및 임상 연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 유전체 해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관련 연구단체 등에 따르면 HGP가 지난 2003년 13년의 노력 끝에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RNA 전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진정염색질'(eurochromatin) 부위에 집중했다. 상당한 성과였지만 고도로
반복되는 '이질염색질'(heterochromatin) 부위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아 기능이
불분명한데다 분석하기도 까다로워 연구되지 못했으며, 곳곳에서 구멍으로 남겨져 있었다.
연구팀은 남은 8% 중에는 단순한 것 이상이 담겨 있었다면서 RNA로 전사해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아도 세포 기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 암과 같은 이상 세포분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록펠러대학의 에릭 자비스 박사는 이와 관련,
"유전체의 92%가 오래전에 분석이 끝나 나머지 8%는 별 기여를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8%를 통해 세포가 분열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T2T는 총 30억5천500만 염기쌍과 1만9천969개 유전자로 된 유전체 지도를 내놓았다.
유전자 중 약 2천 개는 새로 규명했으며, 대부분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나 115개는 활성
유전자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또 200만 개의 유전적 변이를 찾아냈으며 이 중 622개는
의학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연구팀은 세포분열 후기에 딸 염색체가 붙어
있는 염색체 내 영역인 '센트로미어'(centromere) 영역에 관한 새로운 이해도 얻게 됐다고
밝혔다. T2T를 이끈 NHGRI 책임연구원 애덤 필리피 박사는 "미래에는 개인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자 변이를 모두 찾아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유전체 분석을 진짜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했다.
GHP가 일반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계기는 아마도 97년 영국에서 있었던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아닐까 한다. 양 한마리의 탄생으로 생명복제와 복제인간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학계와 종교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생명복제에 관한법률
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SF 영화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사회가 결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증폭되었고,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GHP가 계획될 때 이미 여러 학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영화 가타카에서처럼 개인의 유전정보를 통해 앞으로 개인의 질병
성향, 성격과 행동양상,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과 사회에 윤리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유전정보를 무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유전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게 될 건지, 인간의 유전자가 사유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사람들을
유전자형에 근거하여 낙인 찍게 되지는 않을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GHP의 완성이 도래한 현재, 기대했던 핑크빛 미래도 염려해왔던 막연한 불안감도 차츰
실체를 드러내며 환상과 불안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와 유전자
지도의 완성은 게놈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인체 탐구의 시작이다. 그리고
게놈프로젝트의 목적은 생태계 질서의 파괴와 인간의 '주문생산'이 아니다.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게놈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영원한 꿈인 생명연장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사해줄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
- 2Document53 pages2taktak2277No ratings yet
- Jcos_2015학년도_교육과정_탐구영역_배경지식_생명과학_II_2Document30 pagesJcos_2015학년도_교육과정_탐구영역_배경지식_생명과학_II_2이상윤No ratings yet
- Kci Fi001380319Document15 pagesKci Fi001380319히부No ratings yet
- AsdddddasdDocument22 pagesAsdddddasd17st03No ratings yet
- 줄기세포치료제 동향 및 전망Document18 pages줄기세포치료제 동향 및 전망SOTANo ratings yet
- 트랜스휴머니즘Document29 pages트랜스휴머니즘잭스No ratings yet
- Ecopsychology - and - The - Human - Newborn KoDocument13 pagesEcopsychology - and - The - Human - Newborn Koziyea11No ratings yet
- 2022한국외대모의논제및해설Document8 pages2022한국외대모의논제및해설sohyun kimNo ratings yet
- 주간뇌연구동향 2016 0826Document29 pages주간뇌연구동향 2016 08262205김명진No ratings yet
- SSR 2 1908Document5 pagesSSR 2 1908taktak2277No ratings yet
- Ì 7ê° 20151117Document19 pagesÌ 7ê° 20151117dbrua12131No ratings yet
- ��3ȸ���̳� �ΰ���ƽ�����ΰ����DZ���Document34 pages��3ȸ���̳� �ΰ���ƽ�����ΰ����DZ���jhsjhs0804No ratings yet
- 영어독해 예습Document19 pages영어독해 예습서예지No ratings yet
- Reading For Today5 Topics Chap 6Document8 pagesReading For Today5 Topics Chap 6박수연No ratings yet
- 20)Document96 pages20)Jisu (Michelle) ChoiNo ratings yet
- 논술 강의자료5Document15 pages논술 강의자료5김민성No ratings yet
- (보도자료) 간질 유발 세포막 단백질 작동원리 규명Document4 pages(보도자료) 간질 유발 세포막 단백질 작동원리 규명nda11-s30925No ratings yet
- 선덕1-1국어딜레마수행Document1 page선덕1-1국어딜레마수행choco080228No ratings yet
- 한국인에서 측만지증의 빈도와 유전양상Document5 pages한국인에서 측만지증의 빈도와 유전양상sohyeonkim0720No ratings yet
- ScriptDocument1 pageScriptManisha DhingraNo ratings yet
- 5Document10 pages5s01091882359No ratings yet
- 뇌는 세계를 어떻게 파괴창조하는가: 말라부의 뇌가소성과 뉴런 이데올로기Document22 pages뇌는 세계를 어떻게 파괴창조하는가: 말라부의 뇌가소성과 뉴런 이데올로기hadongwoonNo ratings yet
- 트랜스포존Document12 pages트랜스포존100 568 최재훈No ratings yet
- [고난도] 2022 9.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_천재(박영목) 1-2 기말 [6문제] [Q]Document7 pages[고난도] 2022 9.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_천재(박영목) 1-2 기말 [6문제] [Q]meejooshinNo ratings yet
- PDF 0003592Document31 pagesPDF 0003592유가은No ratings yet
- 하버마스 담론 윤리Document19 pages하버마스 담론 윤리K WorldNo ratings yet
- 의학개론 정의 요약Document3 pages의학개론 정의 요약drd0829No ratings yet
- Sleep Status Among Older Adults in KoreaDocument7 pagesSleep Status Among Older Adults in Koreachristiancraig1987No ratings yet
- 1094KJAN - Kjan 28 156Document13 pages1094KJAN - Kjan 28 156kellysewonNo ratings yet
- Kseeg040 05 15Document7 pagesKseeg040 05 15seungjinhan8682No ratings yet
- C.E. Sandalcı - Project (Final)Document37 pagesC.E. Sandalcı - Project (Final)popopopppopopopp1No ratings yet
- 나의 하나를 찾았다!Document8 pages나의 하나를 찾았다!조문덕No ratings yet
- 생화학1 과제1 201811026 김성하Document4 pages생화학1 과제1 201811026 김성하김성하No ratings yet
- 챗GPT와 의료의 미래Document6 pages챗GPT와 의료의 미래ljy0713No ratings yet
- C.E. Sandalcı - Project KoDocument70 pagesC.E. Sandalcı - Project Kopopopopppopopopp1No ratings yet
- Book 202111 (15 )Document152 pagesBook 202111 (15 )soyiandcocoNo ratings yet
- 9주차_1차시_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Document13 pages9주차_1차시_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byunseo8No ratings yet
- 4Document5 pages4skyeylakeNo ratings yet
- 플라시보 효과 PDFDocument36 pages플라시보 효과 PDF박건우No ratings yet
- Kci Fi001915861Document34 pagesKci Fi001915861psicosmicusNo ratings yet
- 강 의 계 획 서 (Syllabus)Document5 pages강 의 계 획 서 (Syllabus)박남주No ratings yet
- 비사철 3모둠 발표Document11 pages비사철 3모둠 발표221103No ratings yet
-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Document199 pages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ajowara2No ratings yet
- 별첨2 - 연구주제별 연구계획서Document103 pages별첨2 - 연구주제별 연구계획서Delivery ServiceNo ratings yet
- Ebs 2024 ( )Document21 pagesEbs 2024 ( )goldenfly9128No ratings yet
- 2006 4-4Document2 pages2006 4-4erichong3541No ratings yet
- 2309Document48 pages2309http.cattoNo ratings yet
- 2022 EBS - 수능특강 - 생활과윤리 - 본문 (학생용)Document184 pages2022 EBS - 수능특강 - 생활과윤리 - 본문 (학생용)하유정No ratings yet
- 심화 생명과학Document452 pages심화 생명과학이정민No ratings yet
- 090.. 행크 데이비스-양복을 입은 원시인Document19 pages090.. 행크 데이비스-양복을 입은 원시인정웅일No ratings yet
- PDF - 0003841 2Document10 pagesPDF - 0003841 27tg67y2r4dNo ratings yet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 두 편Document10 pages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 두 편qtjcttg99zNo ratings yet
- 캠벨해답 및 크레딧Document24 pages캠벨해답 및 크레딧SY HNo ratings yet
- The Preliminary Study On Predictive Factor of Dysphagia After StrokeDocument12 pagesThe Preliminary Study On Predictive Factor of Dysphagia After Stroke이현정No ratings yet
- 의식: 의식.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생물학적 리듬의 영향에서 수면과 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단계를 발견하세요From Everand의식: 의식.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생물학적 리듬의 영향에서 수면과 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단계를 발견하세요No ratings yet
-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Document20 pages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minamulNo ratings yet
- 신경건축학적 요소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 의료공간을 중심으로Document7 pages신경건축학적 요소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 의료공간을 중심으로Sim DaeseongNo ratings yet


























![[고난도] 2022 9.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_천재(박영목) 1-2 기말 [6문제] [Q]](https://imgv2-1-f.scribdassets.com/img/document/732272229/149x198/5c92656950/1715656977?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