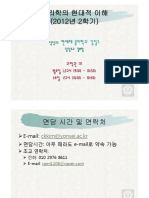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홍성욱 선택적 모더니즘 - (elective modernism) 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 1207
홍성욱 선택적 모더니즘 - (elective modernism) 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 1207
Uploaded by
홍성욱Original Title
Copyright
Available Formats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Available Formats
홍성욱 선택적 모더니즘 - (elective modernism) 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 1207
홍성욱 선택적 모더니즘 - (elective modernism) 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 1207
Uploaded by
홍성욱Copyright:
Available Formats
일반연구논문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홍성욱*
■ 본 논문은 2016년 대학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6S1A5A2A03926283).
본 논문의 일부는 2019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ʻʻ정치사상 워크숍ʼʼ과 2020년 7월 1일에 열린
한국과학철학회, 그리고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심포지엄 ʻʻ과학기술학의 관점
에서 본 세월호 논쟁의 쟁점들ʼʼ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치학과 워크숍에 초청해준 김주형
교수님,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의 심포지엄을 지원해 주신 박상욱 센터장님, 세월호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진실의 힘>의 조용환 변호사님, 초고에 대해 유용한 코멘트를 해 주신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님,
부산대학교 송성수 교수님, 원고와 인터뷰 정리를 도와준 황정하 조교, 그리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생명과학부 전자우편: comenius@snu.ac.kr
본 논문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지난 6년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려 한다. 본 논문은 이 주제를 과학
기술학자 해리 콜린스(Harry Collins)와 로버트 에번스(Robert Evans)의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이론 틀에 비추어서 평가해 볼 것이다. 과학기술이 낳은 논쟁은 정치적 주제와
기술적(technical)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모두 포함하는데, 선택적 모더니즘은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두 그룹—기여 전문가와 상호작용 전문가—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선택적 모더니즘이라는 이론 틀의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례임을 보일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 외에 ‘법적 국면’이 존재했음을 보이고, 이것이
기술적 국면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보이려 한다. 본 논문은 이런 과정을 고려함으로써 과학기술
논쟁을 다루는 선택적 모더니즘의 틀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둘러싼 논쟁이
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주제어❘세월호, 침몰 원인, 선택적 모더니즘, 해리 콜린스, 로버트 에번스, 내인설, 외력설, 법적 국면
102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1.서 론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50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부근에서 승객과 선
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고는 476명의 탑
승객 중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냈던,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
생한 여러 재난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참사였다. 특히 사망
자의 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의 10대 학생이어서, 어린 학생들
의 사망에 대한 전국민의 애도와 분노가 이어졌다.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피한 선원,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해경, 세월호처럼 위험한 배의
과적과 운항을 진행한 해운사, 이를 눈감아줬던 담당 기관, 재난을 지휘
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정부조직,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의혹투성이
였던 국정최고책임자에 대한 원성과 질책이 줄을 이었고, 결국 이런 국
민적인 분노는 2016년에 촛불집회로 이어져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한
국 현대사 초유의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한국 현대사가 세월호 이
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세월호’는 가슴 아프
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김종엽 외, 2016).
그동안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책이 출판되었고,
방송과 토론이 있었다. 법정은 물론 인터넷 공론장에서도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서로 다른 의견과 분석을 주장하는 사람
들 사이에서 대립과 논쟁이 촉발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와 구조
의 과정을 상세하게 재구성한 분석들(진실의힘 세월호분석팀 2016; 416세월
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강정화, 2018),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법학 연
구(최효재, 2017; 이병천・박기동・박태현, 2016), 규제 실패를 다루는 행정학
연구(사공영호, 2016), 세월호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연계시켜서 분석한 인
문사회과학적 연구(지주형, 2014; 고동현 외, 2015; 인문학협동조합, 2015), 언
론의 보도를 다룬 연구(남궁협, 2018), 문학의 존재 의의와 슬픔의 치유를
모색했던 연구(이광호, 2014; 최강민 2017;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등이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03
이루어졌다. 2020년 11월 현재 학술데이터베이스 서비스 DBpia(dbpia.co.kr)
에서 세월호를 검색하면 900편이 넘는 연구가 검색될 정도로 지난 몇
년 동안 세월호는 애도의 대상이자, 연구와 분석의 주제였다.
세월호 침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
은 주제는 ‘침몰 원인’이다. 세월호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고 시야도 좋
았던 조건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좌현으로 기울어졌고,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장시간 바다에 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침몰했
다. 국민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발을 동동 굴리며 지켜볼 수밖
에 없었다. 이 과정을 TV로 직접 목격해서 그랬는지, 세월호의 침몰 원
인에 대해서는 침몰 당일부터 여러 가지 설명, 가설, 의견, 추측이 제기
되었는데, 이는 크게 내인설과 외력설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다른 묶
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인설은 배가 불량한 복원성(ship stability) 같
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상황에서 조타 미숙이나 기계적 결함 등에 의
해서 급선회하다가 기울어졌고, 이후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무너져 내
리고 경사가 더 커지면서, 복원되지 못한 배에 침수가 일어나서 배가 침
몰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외력설은 외부의 어떤 힘이 세월호에 가해졌
고, 이 결과 배가 급선회하고 밀려서 전복되었다는 주장이다. 사고 당시
기상은 쾌청했고 조류나 풍속은 미미했으며 근처에 암초나 다른 배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은 늘어뜨려진 닻이나 세월호와 충돌한 ‘괴물
체’로 압축되었다.
이 서로 다른 두 설명 중 어느 하나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는 쉽게
판가름 나지 않았다. 사고 초기에 검찰이나 감사원에 자문을 하고 자체
보고서를 제출한 전문가들은 내인설을 주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세월
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빨리 수습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여당
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받고 거부되었다. 2015년 1월에
정부에 의해 조직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후 특조위로 약칭)
는 보고서를 내지 못한 채 2016년 9월에 해산되었다. 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정부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선체가 인양된 뒤에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후 선조위로 약칭)는 1년 넘은 조사 활
동을 마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해 내인설과 외력설 두 개의 설명 중에서
104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하나를 선택하는 데 실패하고, 2018년 8월에 내인설과 ‘열린안’1)이라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 보고서 2개를 따로 출간했다.2)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3월에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사건
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후 사참위3)로 약칭)는 2020년 11월
현재까지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견해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
들만이 아니라, 유가족, 시민, 네티즌, 방송인, 영화감독, 기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인’들의 견해의 주류는 ‘외력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물론 이들이
하나의 설명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조수의 영향을 주장
했고, 다른 이들은 원인 모를 물체(거대한 부유물, 고래, 잠수함 등)가 세월
호와 충돌했다고 봤으며, 또 다른 이들은 암초에 의한 좌초를,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의로 풀린 닻이 해저에 닿아 세월호를 선회시켰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서로 날선 논쟁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내
인설이 ‘반동적인’ 정부・여당과 검찰의 공식적 입장이며, 따라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설명이라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본 논문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지난 6년 사이의 논쟁을 심
도 깊고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은 본
논문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한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논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우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
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씌어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조선・해양・선
1) 내인설에 반대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2018년 8월에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자신들
의 입장에 ‘열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열린안’에는 분명하게 외력설을 지지하는 입장과 내인설로
세월호 침몰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을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2018.08.07.) 참조.
2) 이 두 보고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본권 – I (2018)에
묶어져서 출판되었다.
3)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사참위’로 불리는 이유는 위원회의 약칭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05
박 운항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런 주제를 논하는 장에 참여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원인 분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필
자는 이를 과학기술학자 해리 콜린스(Harry Collins)와 로버트 에번스(Robert
Evans)의 ‘선택적 모더니즘’(elective modernism)의 이론 틀에 비추어서 평가해
볼 것이다.
과학기술이 낳은 논쟁은 보통 정치적 사안과 기술적(technical) 주제
에 대한 논쟁을 모두 포함하는데, 선택적 모더니즘은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두 그룹—기여 전문가(contributory
experts)와 상호작용 전문가(interactional experts)—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콜린스와 에번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기술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
러일으켰고, 수년에 걸쳐서 여러 학술지에 이에 대한 비판과 저자들의
화답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사
회적 논쟁을 선택적 모더니즘이라는 이론 틀을 사용해서 분석할 때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시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선택적 모더니즘이라는 틀을 더 유용하고 강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해리 콜린스의 ʻ제 3의 물결ʼ과 선택적 모더니즘
콜린스와 에번스는 2002년에 『과학의 사회적 연구(Social Studies of Science)』에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기술학의 발전을 3단계의 물결(wave)로 나누었다
(Collins and Evans, 2002).4) 첫 번째 단계의 물결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특수
성과 권위라고 간주한 것을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같은 과학사회학
자가 그대로 제시했던 단계였고, 두 번째 물결은 토머스 쿤(Thomas Kuhn)
4) 콜린스가 공저로 출판한 연구들에서 그와 공저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콜린스의 연구는 과거로부터 지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저자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연구를 칭할 때 콜린스 한 명만을 언급할 것이다.
106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이후 과학의 특권을 해체하면서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던
단계였다. 쿤과 사회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은 브라이언 윈(Brian Wynne),
필 브라운(Phil Brown), 스티븐 엡스타인(Steven Epstein), 미셀 칼롱(Michel
Callon) 같은 과학기술학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기술 분야나 의료 분야에
서 발생한 논쟁에서 전문가들 못지않게 기여한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연
구했고, 이에 근거해서 기술 위험을 다루는 위험 거버넌스나 사전주의
원칙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Wynne, 1989; Brown, 1987; Epstein, 1995; Callon, Lascoumes, and Barthe,
2001; 김종영, 2017). 이들은 마치 사회적인 요소들이 개입해서 과학 논쟁
을 종식시키고 과학 지식을 안정화하듯이,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술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고 논쟁을 합의로 이끌 수 있다고 보
았다(Fiorino, 1990).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기여나 일반 시민들의 기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의 전문성’(lay expertise)5)이라는 개념에 가
장 잘 축약되었다(Epstein, 1995).
콜린스의 초기 연구도 이 두 번째 물결에 속했다. 콜린스는 1970
년대 초반에 물리학자들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같은 간단한 인공
물도 설계도나 설명서만으로는 복제(replication)가 안 된다는 사실을 설득
력 있게 보이면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Collins, 1974), 조지프 웨버
(Joseph Webber)의 중력파 발견에 대한 논쟁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현상의
발견에 필연적으로 ‘실험자의 회귀’(experimenter’s regress)라는 본질적인 미결
정성이 존재함을 주장했다(Collins, 1981b; 1985). 이런 미결정성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요소들이 개입함으로써 안정화되었고, 이런 과정은 과학
의 지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사회구성주
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Collins, 1981a). 콜린스의 저술(Collins and Pinch,
1993)은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어서 과학자들과 합리주의 과학철학자들
을 당혹케 했으며(Laudan, 1982; Franklin, 1994), 이는 1990년대에 진행된 ‘과
학전쟁’에서 콜린스를 과학자들의 공적(public enemy) 중 하나로 만들었다
5) lay expertise는 과학기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아직 공인된 번역어는 없다. 여기에서는 심
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반인의 전문성’으로 번역한다.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07
(홍성욱, 1997).
중력파에 대한 첫 연구 이후에 콜린스는 중력파 연구자들을 30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실험이 의심스러운 실험에서 숱
한 사회적, 정치적 요소로 점철된 1조 원짜리 거대과학인 라이고 프로젝
트(LIGO Project)로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Collins, 2004; 2013; 2017). 중력
파에 대한 연구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콜린스는 MIT에서 안식
년을 보내면서 그 곳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에 대해서 민족지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책을 출판했고(Collins, 1990), 이를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분석틀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Collins and Kusch, 1998). 그
는 초기부터 인간과 비인간을 대칭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행위자 네트
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Collins and Yearley,
1992). 콜린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가 결코 대칭적이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
간의 복잡한 행동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
장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복잡한 행동, 특히 습득하기 어려운 지식이나 숙련에 기초한 행동은 사
람의 ‘삶의 양식’(form of life) 속에 온전히 위치시켜야만 이해되거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과학 지식의 사회성을 강조했던
그의 초기 연구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Collins, 1985).
그렇지만 콜린스는 에번스와 함께 쓴 2002년의 논문에서 두 번째
물결을 넘어선 세 번째 물결을 제창했다. 자신이 속해 있던 두 번째 물
결이 너무 극단적으로 발전해서, 여기 속한 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지
식과 전문가들 지식의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
문이라는 것이었다(Collins and Evans, 2002).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발발
하는 여러 기술적 논쟁과 관련해서 ‘일반인의 전문성’을 가진 대중이 이
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을 보완하고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런 극단적
인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 콜린스의 판단이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물결(Third Wave)을 제안했는데, 그 핵심은 ‘누가 기
술적 의사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규범적으로 정하는 기
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108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콜린스의 「제3의 물결」 논문에 나온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논쟁에는 주민, 시민, 정치인, 관련 과학기술 전
문가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이 참여하는 토론은 보통 과학기술의 전문
적인 문제를 논하는 기술적 국면(technical phase)과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
는 정치적 국면(political phase)으로 나뉘는데, 콜린스는 기술적 국면이 전
문가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비전문가들은 이런 기
술적 세부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적 문제를 고려
할 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평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나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6),
콜린스는 두 가지 점에서 자신과 이들을 차별화한다. 첫 번째로, 논쟁의
기술적 국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그 논쟁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전
문가만이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콜
린스는 전자를 ‘기여전문가’, 후자를 ‘상호작용전문가’라고 불렀다. 상호작
용전문가들은 기여전문가들의 지식이나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들과
토론도 가능한 사람들이었다.7) 다만 상호작용전문가들은 기여전문가들이
하는 실험적 연구를 직접 하지는 못한다는 데에서 기여전문가들과 차이
가 있었다. 두 번째로, 위험평가에서는 기술적 국면이 정치적 국면에 선
행되었지만, 콜린스는 정치적 국면이 기술적 국면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이루어내는 정치적 결정은,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이에 반하는 식으로 이루
어져도 무방했다. 또,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기술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
6) 위험평가 연구자들의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환・홍성욱(2015)을 참고하라.
7)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기여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전문가가 기여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상호작용 전문성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니다. 기자와
같은 사람들은 상호작용 전문성이 없으면서 전문가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을 매개할 수 있다. Collins
and Evans(2002), pp. 257-258을 참조. 과학기술학자 김지연 박사는 interactional에 대해서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보다 전문가와 공적 영역 사이의 소통의 의미를 강조하는 ‘연계’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는
데(필자와의 개인적인 이메일), 이런 선택은 원저자의 의도와는 조금 빗나간 번역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09
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예
비적인 기술적 결론을 근거로 해서 시급하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정치 철학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봐도 정치
적 결정이 기술적 결정에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적 결정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콜린스의 주장이었다
(Collins and Evans, 2002).
콜린스는 자신의 이런 입장을 “제3의 물결” 혹은 “전문성과 경험
연구”(Studies in Expertise and Experience, SEE)라고 불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 된다.
1) 현대 기술이 낳은 논쟁에 대한 토론을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으로 나눈다.
2) 기술적 국면은 기여전문가와 상호작용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논
의되며, 의사결정 역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정치적 국면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주도한다.
4) 기술적 국면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결정은 정치적 국면에 넘겨
진다.
5) 정치적 국면에 참여하는 시민과 정치인은 기술적 결정을 최대
한 고려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나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기술적 결정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기술적 결정이 충분히 내려지기 전에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6)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기술적 판
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논쟁의 대상이 광우병이던 GMO(Genetically Modified Objects)이던 크
리스퍼-카스9(Crispr/Cas9) 유전자 가위이던 인공지능이던, 기여전문가와 상
호작용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렇게 극히 제한된 전문가 집단은 콜린스가
1970년대에 발전시킨 ‘코어셋’(core-set) 개념에서 유래했다. 콜린스는 중력
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중력파
110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물리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명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코어셋이라고 명명했다(Collins, 1981b).8) 콜린스의 코어
셋은 토머스 쿤이, 패러다임을 공유한 과학자 집단이 보통 100명 내외,
어떨 때는 25명 정도라고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과 비슷한 집단이었
다(토머스 S. 쿤, 2013[1962]). 콜린스는 기술적 위험에 대해서도 이런 코어
셋이 존재하며, 기술적 국면에서의 토론이 이들에게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코어셋에 포함되는 사람이 가진 전문성 중에 기여전문성은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성이며, 이에 대해서는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상호작용전문성은 그렇지 않다. 이 개념은 콜린스가 민족지
(ethnography)적인 현장 연구를 통해 얻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
안 중력파 물리학자들을 관찰하면서 중력파 물리학의 발전 과정을 연구
했는데, 어느 시점에 자신이 중력파라는 주제에 대해서 물리학자들과 자
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력파에 대한 논문을 읽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습득했음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가
물리학자들처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콜린스는 자신이 가
진 이런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상호작용전문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콜린스는 중력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와 자기 자신을 블라
인드 테스트해서 누가 진짜 중력파 연구자인지를 알아맞히는 일종의 튜
링테스트(Turing test)를 실시했는데(Collins et al., 2006), 질문을 던진 사람은
누가 진짜 중력파 연구자이고 누가 사회학자 콜린스인지 맞추지 못했다.
콜린스의 전문성은 기여전문성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Giles,
2006).
이런 경험은 그의 또 다른 관찰과도 공명했다. 고에너지물리학을
전공하고 라이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물리학자 샌더스(Gary Sanders)
는 콜린스에게 자신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간섭계를 만드
는 데 필요한 적응광학(適應光學, adaptive optics)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
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토론에도 낄 수
8) 코어셋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를 토대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코어그룹
(core-group)이라고 했고, 이 코어그룹의 멤버들의 수는 코어셋보다 2-3배 많다. 과학자 공동체(scientific
community)로 가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Collins(1981c) 참조.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11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광학전문가들과 달
리 간섭계를 직접 제작하지는 못했다(Collins and Evans, 2007: 64; Collins and
Sanders, 2007). 콜린스는 이렇게 자신과 같은 사회과학자나 샌더스 같은
매니저에게서 상호작용전문성을 발견한 뒤에, 번역가, 맹인 등 더 많은
그룹에서 독특한 상호작용전문성을 찾아냈다(Collins et al., 2006).
콜린스는 왜 기술적 국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의 전
문가에 국한했을까? 그는 중력파 연구를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과학에 개입하는 사회적 요소에 ‘내적’(intrinsic) 사회적 요소와 ‘외
적’(extrinsic)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초기 중력파 논
쟁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경쟁, 권위, 평판, 연구비 지원 등 여러
사회적 요소들이 개입했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 내적 사회적 요소였지
과학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요소는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에 구 소련에
서 일어났던 뤼센코(Lysenko) 사건의 경우는 외부의 정치적 요소가 과학의
발전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결국 과학이 추구하는 진실성을 오염
시켰다(Collins, Weinel, and Evans, 2010: 198). 콜린스는 같은 구분이 논쟁의
기술적 국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 과학기술이 야기한
논쟁을 다룰 때 기술적 국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아는 전문가들의 논의
를 통해 결론을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중력파 같은 과학의 전문
분야에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콜린스의 주장은 시민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국면에서 빠진 시민들이 정치적 국면에서 더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런 구분은 더 좋은 정
책,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의 요체였다.
1930년대에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보편주의, 집합주의, 무사
무욕, 조직된 회의주의라는 과학의 4가지 규범과 과학적 에토스를 제시
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런 과학의 규범이 파시즘의 등장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Hollinger, 1995; 홍성욱, 2016). 지적 맥락은 많이 달랐지만, 칼 포
퍼(Karl Popper)가 과학의 개방성과 반증 가능성을 주장했을 때에도 과학
의 가치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머튼의 열망을 공유
112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를 쓴 쿤은 과학이 개방적이라기보다는 독단적
(dogmatic)임을 역설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맹목적으
로 패러다임을 수용한 채로 패러다임이 제기한 미해결 문제를 풀거나,
이론과 실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청소작업’(mopping-up) 비슷한 것이었
다(토머스 S. 쿤, 2013[1962]). 쿤을 계승한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학과 다른
지식이 모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다른 지식보다 우
월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공유된 생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과 과학이 권위를
갖게 되는 과정이 모두 정치적 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형태를
바꾼 정치”(science is 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해석했다(Latour, 1993:
228-229). 과학 지식이 얻어지는 과정과 사회적 논쟁이 해결되는 정치적
합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과학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졌
을 때, 콜린스는 과학과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할 당위성을 다시 제기했
던 것이다.
콜린스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 전문성이 훼손될 때 진실만
이 아니라 과학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훼손되는 과학의
가치는 바로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였다. 콜린스에 의하면 과
학은 다른 어느 학문 분야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야였다. 이 외에도
과학의 가치는 계속 찾아질 수 있었다. 관찰에 대한 존중, 정직성, 진실
성, 무사무욕, 보편주의, 조직된 회의주의, 반증과 개방성, 재연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콜린스는 이런 과학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사이에
상당한 교집합을 발견했다.9) 그는 지식의 보편주의가 받아들여지는 사회
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민주주의의 정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정직
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도, 개방성을 높게 사는 사
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도 민주주의의 성숙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9) 물론 과학과 민주주의는 같은 것은 아니다. 관찰하고 비교해서 더 우수한 논증을 선택한다는 과학의
형성적 열망은 민주주의적 절차와 공통점이 있지만, 과학에는 있지만 민주주의에는 없는 것도 있고, 거
꾸로 민주주의에는 있지만 과학에는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
의의 가치는 과학에서 찾아질 수 없다. 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2018) 참조.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13
콜린스는 과학의 이런 가치를 ‘형성적 의도’(formative intention)라고 불렀고,
과학의 가치를 사회와 문화의 핵심 가치로 선택하는 철학적 입장을 ‘선
택적 모더니즘’(elective modernism)이라고 명명했다.10)
선택적 모더니즘 중에서 ‘선택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학의 가치
를 선택한다는 의미이고, 모더니즘은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
가 아니라 ‘과학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진실(post-truth)이 아닌) 가치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그는 나중에 형성적 의도를 ‘형성적 열망’(formative
aspiration)이라고 다시 명명했고, 형성적 열망의 18가지 가치를 목록화했
다.11)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열거한 형성적 열망들 속에는 콜린스가 예
전에 강하게 비판했던 ‘제1의 물결’에서 간주한 과학의 규범들, 그가 참
여한 ‘제 2의 물결’에서 과학의 특성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던 것들, 그리
고 2002년에 그가 새롭게 제창한 제3의 물결에서 주목한 요소들이 섞여
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콜린스에 의하면 이것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한 ‘삶의 형식’의 과학 버전(science version)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머튼
이 1930년대에 전체주의의 위협에서 민주주의를 구할 가치를 과학에서
찾고자 했다면, 콜린스는 브렉시트(Brexit)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21세
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과학의 가치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 2018).
과학의 가치를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1920-30년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테크
노크라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콜린스는 선택적 모더니즘에서는 정치적 국면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술이
정치를 인도하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와 다르다고 변호했다. 또, 그는
선택적 모더니즘에서는 정치적 국면이 기술적 국면의 결론을 왜곡해서
10) 선택적 모더니즘의 정의가 가장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 글은 콜린스의 미출판원고다. Harry M. Collins,
“Elective Modernism,” unpublished document (2010) at sites.cardiff.ac.uk/harrycollins/files/2016/02/elective-modernis
m-4.doc 참조.
11) 그것들은 뿌리가 얕은 정당화, 전문성, 접근 방법과 규범, 최선의 결정, 관찰, 입증/복제 가능성, 반
증, 보편주의, 무사무욕, 비판에 대한 개방성, 정직성과 성실성, 적절한 해석의 위치, 명확성, 개인주의,
연속성, 개방성, 일반성, 전문성의 가치 등이다 (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 2018: 49-92, 특히 85쪽의
표를 볼 것).
114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포퓰리즘
(technological populism)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콜린스에 의하면 선택
적 모더니즘은 기술관료주의라는 스킬라(Scylla)와 기술적 포퓰리즘이라는
카리브디스(Charybdis)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결론을 내기 힘든 기술적 논
쟁에서 과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두 유지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
하는 ‘제3의 길’인 것이었다.
3.제3의 물결, 선택적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ʻ부엉이들ʼ
‘제3의 물결’에서 최근의 선택적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콜린스가 제시
했던 여러 주장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그가 논쟁의 기술적 국면
과 정치적 국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전자에 일반 시민을 배제하면서
기여전문성과 상호작용전문성만을 가진 전문가들만을 제한적으로 포함
시켰다는 점이다. 콜린스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런 배제와 제한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콜린스도 엡스타인이 연구
한 AIDS 활동가들이 상호작용전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처음부터 기술적 국면이 전문가
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AIDS 활동가들이 이런 전문성을 발전시킬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을 것이었다. 이는 전문성이 미리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획득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Jasanoff, 2003; Epstein, 2011). 실제로 독성물질에 노출된 공동체의 대응을
분석한 필 브라운의 연구는 주민들이 전문지식을 매우 빠르게 습득했음
을 보여주는데(Brown, 1987), 처음에 기술적 국면이 전문가들에게만 제한
되어 있었다면 역시 이들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었다.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전문가들을 규정하는 것이
나라마다, 시기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법정이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위원회가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르
며, 시민들이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다르다. 정치와 기술의 경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15
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위험분석틀에서는
정치적 결정과 기술적 결정의 국면이 선명하게 나뉘어 있지만, 유럽의
사전예방원칙에서는 그렇지 않다(Turner, 2001; Jasanoff, 2003). 이러한 사례
들은 기여전문가와 상호작용전문가라는 콜린스의 두 범주가 임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국면과 기술적 국면을 구분하고, 후자를
전문가들에게 할당함으로써 주민, 시민, 환자들이 겪는 복잡한 갈등을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기술적’인 문제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는 것
이었다. 엡스타인이 연구한 AIDS 활동가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는 약의
효능, 이중맹검법(double-blind test)의 효용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정부 정책의 무능함,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에 대한 저항 같은 정치
적인 문제들이 다 엉켜있었다(Epstein, 2011). 이들에게 기술적 문제와 정치
적 문제는 분명하게 잘라낼 수 없는, 넝쿨처럼 얽히고 설킨 것이었다.
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진 불만은, 현재 의학의 수준에서도 치료 가능
한 병을 충분히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기술적 불만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에 덧붙여서 과학의 권위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정치적
인 불만이 중첩된 것이었다. 이렇게 과학과 정치는 뗄 수 없다는 것이
콜린스에 대한 비판자들의 주장이었다.
콜린스의 비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
을 나누는 것은 정치적 권위를 가진 제도로서의 과학과 지식을 낳는 행
위로서의 과학을 구분하고 논의를 후자에만 국한하는 것이다. 사실 윈
같은 과학기술학자가 계속 비판한 것은 주민이 느끼는 과학과 전문가들
의 과학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Wynne, 2003; 2008). 윈에 의하면 시민
들은 과학과 복잡한 세상의 이슈들을 분리하지 않고 논의하지만, 많은
경우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모호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과학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시민이나 주
민들이 전문가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다가 좌절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이런 태도에 대한 실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더 많은 수평
적 소통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기술적 국면에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야 한다는 콜린스의 주장은 결국 과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망을 증폭
116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시키고, 콜린스의 바람과는 반대로 과학과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윈 같은 학자의 비판이었다.
윈이 콜린스의 ‘제3의 물결’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 논쟁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윈은 낡은 브렌트스파(Brent
Spar) 원유 저장시설을 견인해서 북해에 수장하려던 석유회사 쉘(Shell)의
시도가 그린피스와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된 사례를 들면
서 기술적 국면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Wynne, 2003). 비록
당시 그린피스는 이 시설이 수장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했지만, 반대 운동을 통해서 ‘브렌트스파 원유 저
장시설을 수장하는 것이 안전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석유회사와
과학계의 문제 제기 대신에,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안전한가,’ ‘대체 안
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북해에는
이 비슷한 저장시설이 수백 개가 있는데, 브렌트스파 시설의 수장이 안
전하다고 해서 이를 수장하면 다른 비슷한 시설도 수장하는 방식을 따
를 것이며, 이런 연쇄적 조치가 가져올 환경파괴의 위험성은 명확했다.
결국 그린피스의 반대는 쉘과 이를 허용한 영국 정부의 정책 변경을 가
져오는 데 성공했고, 브렌트스파 시설은 해상에서 해체되어 지상에서 폐
기되었다. 윈은 이 사례를 통해 기술적 문제에 시민이 참여할 때 더 좋
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심해에 수장하는 방식으로 유전 설비를 해체하는 것이 환경에 위
해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결론에는 다국적 거대기업인 석유회사 쉘의
‘사악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쉘에 동의했던 영국 정
부도 쉘의 로비나 정치자금 등과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실
제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에서는 이런 의혹과 가능성들이
발견된다. 석유회사의 지원을 받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촉발한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아 담배가 중독성이
없다거나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한 연구, 혹은 세월호처럼
여론의 악화를 최소화해서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유지하려는 정치권의
공작이 개입된 문제 등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것들이다.
콜린스와 에번스는 윈의 비판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흔히 과학적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17
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Collins and
Evans, 2003). 첫 번째는 “사악하게 틀 지워진 문제들”이었다. 이는 과학적
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정의나 공정을 침해하는 문제들이고, 따라서
과학기술학자들이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위선을
폭로해야 하는 문제였다. ‘IQ가 유전되기 때문에, 흑인의 성취는 낮을 수
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은 꼭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종차별의 의
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그 자체를
비판하고 반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학을 비판하
는 시민들이 있다면, 과학기술학자는 이들의 비판이 옳다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으로(scientistically)12) 틀 지워진 문제들”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과학으로만은 해결되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답할 수
있는 명제적 질문(propositional questions)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두
번째 유형과 첫 번째와의 차이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룰 때는 과학에 의
한 분석 자체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런 구분에
의하면 ‘사악하게 틀 지워진 문제’처럼 보이는 브렌트스파 유전설비 문
제 속에 ‘과학으로 틀 지워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
렌트스파 설비를 심해에 수장하는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가?”라는 명제
가 바로 이런 명제이며, 콜린스와 에번스는 이 문제가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피스가
이 경우에 오염 정도를 잘못 추정했다는 것을 나중에 시인했다는 사실
은 이 문제가 ‘과학으로 틀 지워진 문제’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콜
린스와 에번스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대기업, 악덕기업, 정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이 관여되어 있는 사안이
라고 무조건 ‘사악하게 틀 지워진 문제’로 간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반대 운동만이 효과적이라고 미리 상정할 필요
는 없다는 것이다(Collins and Evans, 2003).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안을 구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쉽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콜린스는 ‘브렌트스파 설비를 심해에 수장하는
12) 여기서 콜린스와 에번스는 scientifically 대신에 scientistical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 뉘앙스의 차
이를 살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과학으로’라고 표현했다.
118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가’, ‘GM 식품이 쥐의 위장에 암을 유발하는가’
같은 문제가 과학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
단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일치된 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 GM 식품이 실험쥐에게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과학자들이 있
는 반면에, 이 실험이 터무니없는 얼치기 실험이라고 비판한 과학자도 많
이 있다(Krimsky, 2015). 브렌트스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Huxham and Sumner, 1999). 우리나라의 논쟁을 봐도 4대강의 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가라는 자명한 명제적 질문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의견이 나
뉘었고(박서현, 2015), 서로 자신이 옳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기후변화나 담
배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바뀌는 이유도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면서 사태에 만족하
지 못하는 시민들이 공공정책 같은 정치적 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하기 때문이다. ‘사악하게 틀 지워진 문제’나 ‘과학으로 틀 지워진 문제’
모두 전문가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어느 정도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의 특징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Funtowicz and Ravetz, 1993).
2002년 논문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될 때 콜린스와 에번스는 이 문
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합의가 안 된 과학도
시간이 흐르면 정상과학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기다리면 합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빨리 정책을 결
정해야 하는 것들이고, 이럴 경우는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과학의 가치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는가? 2017년에 콜린스와 에번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 그것은 “부엉이”(Owls)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으
로 하여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대립하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
나 비전문가 중에서 어느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제시하게 하자
는 새로운 제안이었다(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 2018: 122-138).
왜 이 집단의 이름이 ‘부엉이’였을까? 부엉이는 고개를 좌우 180도
까지 돌릴 수 있는 조류이다. 부엉이 그룹은 ‘기술적 국면’에서 논쟁하는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19
두 전문가 그룹의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이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이 있는가 하는 점을 ‘정치적 국면’에 넘겨줌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하는
집단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콜린스가 생각한 부엉이 그룹은 논쟁
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동시에 양쪽 모두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과학자들로 주로 구성된다. 이들은
논쟁이 되는 이슈를 놓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합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자면 A에서 E까지의 ‘합의 지수’(consensus index)로 표시
해서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 과학자사회 내에서의 합의를 정량적으로 측
정하는 여러 방법론들이 개발됨에 따라(Shwed and Bearman, 2010), 합의의
정도를 가늠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고도 판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엉이 집단은 ‘백신과 자폐증의 인과관계가 없
다’는 가설에 대한 과학자 집단의 합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9.5라는 식
으로 정량화된 결과를 정치적 국면에 제공할 수 있다(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 2018: 129-135).
물론 콜린스와 에번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문성과 정치가
혼재된 사안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만 뽑아내서 이에 대
해 합의 지수 같은 것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과정이라
고 비판한다(Wehrens, 2019).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시민의 참여를 부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다. 과학자들 사이의 합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20년 동안
지켜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도 콜린스의 제안의 약점이 될 수 있
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스는 사회가 과학이 가진 가치를 핵심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과학자사회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를 이들에게 위임하는 것만이 결국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방법
이라고 본다. 누구나 모든 문제에 참여해서 개진하는 의견이 여론 형성
13) 이런 합의 정도의 정량적 평가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출판한 논문
에 대한 인용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한다. Shwed and Bearman(2010) 참조.
이런 방법의 문제는 논란이 되는 사안이 생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합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의 경우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문가
들이 세월호의 항적, 모형실험,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출판한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침몰 원인에 대
한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는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이런 가늠은 합의
의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120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에 주가 된다면, 이런 여론은 최근에 학계에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
는 ‘탈진실(post-truth)’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
다(Collins, 2017).
전문성이 기능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답을 얻어서, 불완전하나마 이를
정치적 논의를 하는 집단에 넘겨주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야말
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지하고 탈진실의 위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콜린스의 ‘선택적 모더니즘’의 요체이다.
이제 이런 틀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에 적용해 보자.
4.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던 사건이었
다. 특히 사고 당일에 승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고, 국
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가 곧이어 대부분의 승객이 갇혀 있으며 결
국 3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야 했다. 국민
들은 뒤집혀진 세월호 주변에 구조 선박이나 헬기가 우왕좌왕하는 장면
을 발을 동동 굴리며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왜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도피했는지, 현장에 급파된 해경 123정이 왜 적극적으로 승
선해서 승객을 구하지 못했는지를 납득할 수 없었다. 4월 16일과 17일,
대부분 언론사는 기자들을 진도에 급파했고, 다음 날부터 현지에 나간
기자들은 팽목항에서 생존자와 가족들을 인터뷰하면서 ‘속보’ ‘특종’을 쏟
아내기 시작했다.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회장은 전두환 정권 시
절에 정경유착을 통해 한강유람선사업을 운영한 세모그룹의 창업주였고,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구원파의 교주라는 소문이 있던 사람
이었다. 그는 세월호사고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21
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켰다.14) 이 외에도 세월
호가 국정원이 운영하던 배라는 의혹(이현수, 2014. 4. 20), 박근혜 당시 대
통령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었다(이찬열, 2014.
5. 13). 특히 박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정윤회15)와
의 밀애설을 보도했고, 이 소문은 박근혜와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의 과
거의 숨겨진 관계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으며(2014. 8. 7. 경향신문), 이는
결국 ‘최순실 게이트’를 열었다. 그 뒤에 세간에는 세월호를 종교인 최태
민의 기일에 맞춰 제물로 바쳤다는 ‘인신공양설’ 같은 흉흉한 풍문이 떠
돌았다. 이런 풍문은 주로 SNS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주류 언론에서도 풍
문들 중 일부가 보도되기도 했다(권경성, 채지선, 박주희, 2016. 10. 29).
루머들을 차치하고라도 보도된 뉴스만 봐도 의혹투성이였다. 우선
세월호 사고가 공식적으로 보도된 시간인 오전 8시 48분보다 이전에 일
어났다는 증언이 많았다. 구조자 중에 한 승객은 사고 전날 밤에 세월호
가 15도 기운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고(김덕현, 2014. 4. 17), 한 어민은 아
침 8시부터 커다란 배가 바다에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여
운창, 2014. 4. 16). 한 네티즌은 이른 아침 7:30에 KBS 속보를 봤다는 글
을 인터넷에 올렸고,16) 생존한 승무원 중 한 명은 7:45에 쿵 소리와 함
께 배가 급격히 기울어서 테이블의 맥주 캔이 바닥으로 굴렀다고 시간
을 적시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박기용, 2014. 4. 20). 이런 증언은
사고 시점으로 알려진 시각 이전에 배에 큰 이상이 있었거나, 실제 배의
침몰을 가져왔던 사건이 공식 사고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고(연합
뉴스, 2014. 4. 18), 어떤 이유에선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
으키기에 충분했다.
14)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는 집단자살 이단종파 오대양사건 가족!!!”, (2014. 4. 21), http://bbs1.agora.medi
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93769 유병언과 구원파의 관계에 대한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실린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가장 활발한 공론장 기능을 담당했던 다음 아고라는 2019년
1월에 15년의 서비스를 끝으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아카이브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아고라에 실린 글
들은 다른 블로그 등에 복사된 것만 인용했다.
15) 정윤회는 사이비 종교인이자 박근혜의 오랜 측근이었던 최태민의 사위였다. 그의 전처가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었다.
16) 하늘티 “세월호 침몰 최초 보도 뉴스는 오전 7시 30분경입니다”, (2014. 4. 17), http://bbs3.agora.medi
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474850
122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이런 의혹을 증폭한 상황은 ‘급변침’이었다.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에 공개된 세월호 항적도는 8시 48분 37초에 배가 115도만큼 급변
침을 한 것으로 그려져 있었다. 항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같은 큰 배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급변침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론과 네티즌은 세월호가 무엇인가와
충돌해서 급변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14. 4. 17). 그렇지만
급변침의 실상은 항적도가 누락된 것 때문이었고, 4월 22일에 공개된 항
적도에는 급변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침’이라는 프레임은
계속 세월호를 따라 다녔는데, 예를 들어 언론은 복원된 항적도를 자세
히 관찰한 뒤에 세월호가 8시 49분 12초와 13초 사이에 단 1초 만에 10
도 급변침을 했음을 보이면서, 이를 두고 세월호가 정상적으로는 가능하
지 않을 만큼 크게 변침했다고 다시 보도를 했다(YTN, 2014. 4. 25; 한겨레,
2014. 5. 20;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6. 3). 누락된 상태로 공개되었
다가 복원된 항적도는 이후 다시 수정되었는데, 몇 차례에 걸친 항적도
가 수정되면서 나중에는 항적도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
다(MBC, 2014. 7. 28).
항적도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배에 외력 비슷한 것이 작용했다는 증언 때문이었다. 생존자
들 중에는 “쿵”하는 소리가 난 뒤에 배가 가라앉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두고 언론과 네티즌은 배가 무엇인가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초기에 KBS, YTN 등의 주류 언론에서 이미 세월호가 암
초, 큰 원목, 잠수함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강한 조류에 의해
서 닻을 묶은 쇠사슬이 풀어져 닻이 해저에 걸렸을 가능성도 일찌감치
등장했다(조현호, 2014. 4. 17). 타는 냄새가 났다는 증언 때문에 내부에서
무엇인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17)
17) “[스크랩] 세월호 폭발에 의한 침몰? - 화상환자,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2014. 5. 4.),
http://blog.daum.net/taxitriton/995.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23
<그림 1> 2014년 6월, <한국청년연대>에서 제작한 “세월호 참사 밝혀야 할 10대 의혹” 중
첫 번째 의혹에 대한 포스터. 급변침에 대한 의혹, 급변침이 없었다는 설명에 대한 의혹, 3
등 항해사가 목격한 배에 대한 의혹이 첫 번째 의혹으로 꼽혔다.
출처: http://sewolho416.org/671
124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사고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의심은 일상적인 상황도 과장되어 해
석하게 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선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3등 항해
사가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다”는 증언을 하자(노컷뉴스, 2014. 6.
11), 이 진술이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선회하다가 침수되었다는
식으로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술에서 언급한 배는 배가 아니라 실
제로 잠수함이었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되기도 했다.18) 이런 황당한 해석
들이 주류 언론에 의해서 ‘특종’ ‘특보’의 형태로 경쟁적으로 보도되었고,
네티즌에 의해서 덧붙여지고 과장된 형태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게
시판에 포스팅되고 복사되어 확산되었다.19)
잠수함설을 확산한 계기는 2014년 6월에 있었던 JTBC의 보도였다.
JTBC는 6월 25일에 진도 VTS가 기록한 세월호의 레이더 항적을 입수해
서 이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 동영상에
는 세월호가 급선회할 때 주변에 잠깐 동안 다른 물체가 레이더에 잡히
는 것을 보여주었다(JTBC, 2014. 6. 25). 해설자는 이를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라고 논평했지만, 외력에 대한 의심이 널리 퍼져있던 상태에서
이것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잠수함이라는 주장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게 번져 나갔다.20) 네티즌들은 레이더의 분해능을 비교하면
서 이것이 컨테이너일 수가 없다고 했고, 심지어 당시 조류에 대한 정보
를 찾아서 세월호의 항적과 조류의 움직임을 함께 계산할 때 레이더에
잡힌 괴물체의 궤적이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일 수 없다고 주장했
다.21) 나중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표류한 지점에다가 컨테이너 8
18) “[스크랩] 세월호 3등항해사 박한결 잠수함 보았다고 법정에서 증언!!!!” (2014. 11. 10), http://blog.dau
m.net/neo1000g/3969383. 실제로 박한결이 본 배는 맹골수도를 지나던 <한수호>였고, 그녀는 멀리 떨어진
전방에서 배가 오자 전방을 주시했을 뿐이었다.
19) 세월호 사고가 난 뒤에 4개월 뒤에 출판된 곽동기(2014)는 침몰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로 1) 조타미
숙으로 인한 급변침, 2) 잠수함 충돌, 3) 좌초, 4) 내부폭발, 5) 사전음모라는 다섯 가지 가설을 제시하면
서,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러 의혹들을 집대성한 이 책은 참사 초기
에 왜 ‘내인설’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곽동기(2014) 참조.
20) 2014년 당시 이 JTBC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라. 이 초기 댓글들은 당시 뉴스를 올린 유튜브 사
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4zKsg2LocBQ 참조.
21) 항적사수 (2015. 6. 7), “레이다로 추정한 세월호 항적 - 컨테이너의 딜레마”, https://m.blog.naver.com
/actachiral/220382335666.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25
개를 연결한 뒤에 진도 VTS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는지를 실험했고,
레이더가 컨테이너 같이 작은 물체도 또렷하게 탐지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박철홍, 2017. 9. 26). 그렇지만 이 실험은 잠수함 같은 외력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실험을 했던
조건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건이 같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실험 자
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22)
<그림 7> JTBC가 공개한 레이더 영상에서 보이는 신호를 잠수함으로 해석한 한 네티즌의
웹사이트(https://instiz.net/pt/2153912)에는 그림과 함께 레이더 영상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여기엔 아래와 같은 설명이 달려 있었다.
이 그림 상으로 보시면 08시 50분 40초에 이미 세월호의 방향이 급변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분 48초에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에 추가해서 뒤로 늘어지는 주황색 잠수
함의 영상의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분 31초에 세월호와 완전히 분리된 주황색 잠수
함의 영상이 보이고, 그 길이가 세월호(150미터, 폭 22미터)의 길이 2/3, 폭 1/2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
월호가 침몰한 뒤에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꾸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중
22) 예를 들어 항적사수 (2017. 9. 26), “컨테이너 레이다 탐지 실험”, https://m.blog.naver.com/actachiral/221
105784968에 실린 글과 댓글을 보라.
126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앙해양안전심판관이었던 허용범을 단장으로 총 11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고, 이들은 선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4년
8월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
고했다. 서울대 선박해양고도화연구사업단의 조선학자들도 검찰의 요청
을 받아 “세월호 복원 성능 분석”(예비분석, 2014. 4. 29)과 “세월호 전복
시뮬레이션 보고서”(2014, 1차-4차)를 작성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분석
최종 보고서”(2014. 10)를 작성했으며, 감사원도 자체 감사를 통해 보고서
를 작성했다(2014. 10). 해양 사고를 조사해서 판정을 내리는 중앙해양안
전심판원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2014. 12)를 작성
했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안전기술원은 “세월호의 항적과 경사각을 이
용한 전복, 침수과정 재현”(2016. 5)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광주지방법원 1심 및 2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되
어 증언했고, 2015년의 국회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도 증언을 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점검보고서”(2015. 10)에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담겨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세월호 침몰을 복원성 불량, 과적,
급선회, 화물 고박 풀림, 횡경사 발생, 침수와 침몰의 과정으로 설명했
다.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외력에 의한 전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런 위원회나 기관들의 보고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력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중 하나는 복원성 불량, 과적, 급선회, 화물 고박 풀림, 횡경사 발생,
침수와 침몰 같은 요인으로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것이, 세월호 문제
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거의 같은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자식을 잃고 비통해하는 유
가족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사고 조사 과정
에서 배제시켰다. 이런 정부의 냉담한 태도는 보수적인 언론에 의해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중앙일보, 2015. 4. 17).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한 입법을 통해 2015년 1월 1일에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도 방
해했고, 이 역시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김성수, 2015. 12. 17).23) 시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27
민들은 정부・여당이 무언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
을 방해하거나 억압한다고 의심했고,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정
부・여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항적사수, 2016. 1.
24). 침몰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정부・여당이 선호하던 설명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은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며, 따라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졌다.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평온하게 항해하던 세월호는
오전 8시 48분에 갑자기 대각도로 우선회 했고, 이것이 배를 좌현 측으
로 쏠리게 하면서 30도 이상의 심한 횡경사를 낳았다. 원래 복원성이 나
쁜 배였는데, 이러면서 화물의 쏠림과 고박 풀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
것이 복원성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관계자들
이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문제는 무엇이 세월호를 크게 우선회하
게 만들었는가라는 데에 있었다. 처음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세월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타수가 조타 실수를 저질렀고, 이 실수는 조
타수에게 명령을 내린 3등 항해사의 실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했
다.24) 실제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타를 변침할 때 좌현과 우현을 혼동
한 것 같으며, 대각도 조타를 한 것 같다는 진술도 했다. 선원들의 여러
진술들도 타를 변침하는 순간에 배가 갑자기 우선회하면서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1심 법원은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실수
가 이런 대각도 조타를 낳아서 배를 급선회시켰다는 검찰 조사를 수용
해서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실수를 세월호 좌초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25)
그렇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었다. 비록 당시 타를
명령한 3등 항해사가 오랜 경력을 갖고 있던 선원이 아니었지만, 조타수
는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사고 당일 아침은 날씨도
23)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을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드러났다.
24) 2014고합180(이준석 살인등)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의 요약은 조갑제닷컴(2014. 5. 29)에서 볼 수 있다.
25)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선원 1심). 조타수의 증언의 번복에 대해서는 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
(2016), 395쪽을 참고.
128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청명해서 시야도 충분했고 바람이나 파도도 거의 없었다. 맹골수도에는
급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한 이곳은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
호가 일상적으로 지나던 곳이었다. 아무리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일상적
인 5도 변침을 하려다가 20도가 넘는 대각 변침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힘들었다.26)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
했던 항해사와 조타수는 법정에서는 실수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
고,27) 다른 선원들도 이들이 과실이 없었음을 지지하는 진술을 했다. 1
심은 이들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타 실수가 아니라 배의 타를 통제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결함이 세
월호가 보인 것과 비슷한 항적을 낳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조현호,
2015. 12. 3). 항소심 판사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항해사와 조타수
의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의 형을 5년으로 감형했
다(박종대, 2015. 4. 28).
항소심 재판 이전까지의 내인설은 ‘조타실수로 인한 대각 변침 →
대각 우선회 → 좌현 횡경사 → 화물 쏠림 → 고박 풀림 → 복원성 악
화 심화 → 횡경사 심화 → 침수 및 침몰’이라는 연결 고리들의 연쇄로
구성된 내러티브(narrative)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소심 이후에 ‘조타 실수
로 인한 대각 변침’이라는 첫 고리가 사라져 버린 셈이었다. 앞서 지적
했듯이, 전문가들 대부분이 승인한 내인설은 검찰의 공식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이 지지하던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내인설이
근거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항소심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은
‘조타 실수로 인한 대각 변침’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기기고장 가능성’
으로 대체된 것이었지만, 비판자들은 이제 내인설이 침몰 원인에 대한
설명의 지위를 잃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
위원회, 2017). 외력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외력이 바로 내인설이 제공하
26) 진보적인 미디어 <한겨레>(박현정, 2014. 7. 23)나 보수적인 인터넷 미디어인 <조갑제닷컴> 모두 항
해사-조타수의 실수로 세월호가 급변침했다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갑제닷컴>의
기자 이동욱은 이를 두고 “누더기”라고 하면서 항해사-조타수의 과실을 비롯한 공소장의 여러 항목들을
비판했다(이동욱, 2014. 10. 26).
27) 광주지방법원, 「제22회 공판조서」 (2014. 10. 7) 중 3등 항해사 박한결에 대한 공판 참조.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29
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역설했다.28) 이후 고의로 닻
을 내려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주장, 항적도 조작설, 잠수함 충돌설
등이 인터넷 미디어를 타고 방송되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확산되었다.
내인설이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2014~2015년에 구성된 여러 전문
가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신뢰성 역시 추락했다. 외력을 주장하
던 사람들과 이들을 지지하던 시민들은 내인설을 지지한 전문가들, 검찰
과 정부・여당을 함께 비판했다(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외력
설의 부상과 내인설에 대한 비판은 2017년 이후 결성된 선조위의 구성
과 그 활동에도 크게 투영되고 반영되었다. 1년 넘게 활동한 선조위는
숱한 논쟁과 갈등을 겪은 끝에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의 다른 이름)이라
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설명을 담은 보고서 둘을 묶어서 출판했다. 선체
가 인양되고 화물칸의 블랙박스가 복원되었으며, 선체에 대한 자세한 검
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런 미결정은 2020년 11월 현재 활동 중인 사참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5.ʻ선택적 모더니즘ʼ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논쟁
선택적 모더니즘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기술적 국면과 정
치적 국면으로 나누고, 기술적 국면에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
해야 하지만 정치적 국면에는 일반 시민과 정치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여기서 전문가들이란 기여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 중에서 상호작용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선택적
모더니즘에 의하면 정치적 결정은 기술적 결정에 (시간적으로나 방법론적
28) 예를 들어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지은 『세월호참사 팩트체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하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예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라고 결론지었다. 416세월호참
사 국민조사위원회(2017), 89쪽 참조.
130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으로) 선행할 수 있지만, 기술적 결정을 왜곡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
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모더니즘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뉘었을 때에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그룹에게 기술적 문제의 합의의 정도를 평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부엉이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세월호와 관련된 논쟁은 선택적 모더니즘의 유용성과 한계를 모두
드러낸다. 우선 세월호 논쟁에서는 다른 논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문제
와 정치적 문제가 혼재해서 존재했다. 기술적 문제 중 대표적인 것들은
1)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라는 침몰 원인에 대한 문제, 2) 당시 해경이
나 다른 구조대가 구조를 위해 자신들의 소행임을 충분히 했는가라는
문제였다. (1)에는 배의 복원성의 계산, 화물의 총량을 구하는 문제, 블랙
박스 해독, 모의실험의 타당성 평가,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다. (2)는
구조대 지휘관의 판단과 명령의 적절성, 구조대와 세월호 사이의 통신,
구조대들 간의 통신, 구조대와 구조 본부 사이의 통신에 대한 평가가 포
함되었다. 정치적 문제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처벌과 사과의 문제, 기
록과 기억을 담당하는 추모관 등의 건립 문제, 세월호 인양의 문제, 보
상의 문제, 재발 방지의 제도화 등이 있었다.
그런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
지만, 이를 다루는 여러 위원회의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의 절차와 맞물
려 있었다. 즉,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의 문제는 선원과 선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토되었으며, 구조의 문제는 해경이나 진도 VTS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논의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침몰 원인만을 놓고 보
면, 배가 물속에 잠겨있어서 배의 부품이나 블랙박스를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결정적인 문제였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경찰과 검
찰은 선원들을 조사하면서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
목했고, 초기에 자문을 한 전문가들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근거해서
조타실수를 대각도 선회의 원인으로 상정한 채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세월호가 보인 항적도의 궤적을 그릴 수 있는가 등의)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29) 결국 기술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31
시간이나 재원이 주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선원의 과실이 침몰의 1차 원
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기술적인 국면의 내러티브가 짜여졌지만, 이런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선원의 과실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그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콜린스는 과학기술이 낳은 논쟁을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으로
나누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에 걸
쳐지는 또 다른 ‘법적 국면’(legal phase)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
해자가 나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민사・형사 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
우에는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한 자문을 했던 전문가들
의 보고서가 가진 허위성이 드러났고, 이는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홍성욱, 2018). 그렇지만 세월호의 경우에는 침몰
원인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바뀌면서, 검찰 조사에서 자문을 했던
전문가들의 판단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혼돈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력설이 대중들에게 더 호소력을 가지는 설명으
로 부상했다(최인수, 2015.11.13).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던 선조위 내에서도 극복이 되지
못했고, 2020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법적 국면은 기술적 논의를
빨리 종료(closure)시키고 봉인했지만, 이 봉인이 다시 열리면서 기술적 논
의는 다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법적 국면의 존재와
그 역할은 선택적 모더니즘이 과학기술 논쟁을 분석하는 틀로서 실효성
을 갖기 위해서는 꼭 포함시켜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30)
29)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41-42쪽), 대각도 횡경사에 대한
인적 과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합동수사본부 전분가 자문단, 2014).
그러므로 세월호가 조류의 변화가 심하고 통항선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맹골수도 내를 항해할 경우 당직
항해사는 당시 조타술이 미숙하여 입출항 조타에서 제외된 당직조타수에게 변침을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조타명령을 내리면서 변침하는 것이 안전하다. ... 당직 조타수는 처음에는 전과 같이 약 우현 5도의 타각
으로 우현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선회가 잘되지 않아 최소 15도 이상의 큰 각도로 조타하였고 이에 선수방
향이 우현으로 선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수는 예정침로 145도를 넘어 150도까지 지났고 급기야 우현
최대타각인 35도까지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예상보다 큰 각속도로 선회하였으며 선수방향이 08;49;13
부터 08:49:39까지 불과 26초 동안 무려 34도를 빠르게 선회하여 184도가 되었다. 이러한 빠른 우선회는 필
연적으로 선체에 원심력을 발생시켜 ... 급기야 선체가 크게 좌현으로 기울었고, 이와 동시에 경사진 갑판
상에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로 실려 있던 화물들도 동일한 원심력을 받아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선체는 좌
현측으로 약 30도의 대각도로 급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32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월호와 연관된 정치적 국면은 훨씬 더
큰 파행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의 행적이 모호했
고, 세간에는 이와 관련한 흉흉한 루머가 돌아다녔다. 정부・여당은 지지
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사를 차단했고,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무시나 비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무관심과 방해를 낳았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해체되면서,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확신했고, 따라서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내인설’이 진실
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의혹은
선체가 인양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양된 선체에서는 닻에 의한 좌초
나 잠수함 충돌의 흔적이 찾아지지 않았고, 복원된 화물칸 블랙박스에는
배가 기운 뒤에 화물이 쏠리면서 선체에 부딪혀서 충격음을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항소심 재판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 역시 실제로 확인되었다(김성수, 2017. 9. 15). 그렇지만 ‘외력설’은 이
이후에도 잦아지지 않았다. 외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월호의 복원성
이 실제로 꽤 괜찮았고, 내인설로는 세월호의 항적이 나올 수가 없으며,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고 이후에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고장 난 밸
브가 우현 대각도로 타를 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잠수함 같은
괴물체가 충돌한 흔적이나 선체가 찢긴 자국은 찾아지지 않았지만, 외력
설을 주장하던 선조위의 권영빈 의원은 핀안정기(스태빌라이저)실의 강판
이 휘어진 것이 외력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목포MBC, 2018. 8. 1). 이를 보
면 선체 인양 후의 ‘외력설’은 다른 증거들을 부인하고 모든 증거를 자신
에게 맞게 해석하는 ‘음모론’(전상인, 2014)의 성격을 띠었다.31)
30) 이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피해자가 존재한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달리 GMO처럼 미래
에 도래할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는 법적 국면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린스와 에번스가 이
런 사례에만 논의를 국한한 것이 바로 선택적 모더니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법적인 국면을 수반하는
논쟁과 그렇지 않은 논쟁의 차이를 선택적 모더니즘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인
데, 여기서 이 주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31)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분석한 김승주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면밀한 의도
와 준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김어준의 주장은 권력자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며, 잠수
함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자로X’의 주장은 선주나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다고 비판한다. 김승주(2018), 85-90쪽 참조.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33
세월호의 경우에 선택적 모더니즘에서 제안한 ‘부엉이 집단’은 존재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선조위의 조사
가 진행되던 시점까지도 외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의견을 공개적
으로 표출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해양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간한 논문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외력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인 자체를 탐구해 들어가지도 않았다(임
남규 외, 2014; Kim, Seo, and Lee, 2019).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공
신력 있는 기관인 대한조선학회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선조위 외부의 전문가들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선조위의 6명의 전
문가들이 내인설과 외력설을 놓고 3:3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은 마치 조
선・해양 분야의 전문가 집단 전체가 내인설과 외력설을 놓고 의견이 반
반으로 나뉘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32) 선조위에는 과학기술학
(STS)을 전공한 학자 2인이 집필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보고
서 집필이라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의 균형을 잡는 일에 국한되었다.
선택적 모더니즘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
적 국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결론 내려져야 한다는 규범적
(normative)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세월호처럼 인터넷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쟁을 이어간 경우에는, 이런 논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
적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국면에는 조선・해양 분야에서 이론이나 항
해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논쟁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전문
성을 획득했다고 평가되는 시민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포함시켜
야 한다.33) 이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
32) 선조위 위원은 8명이었는데, 이 중 위원장과 제1소위원장 등 두 명은 변호사였고, 부위원장을 포함
한 나머지 6명은 조선공학과 선박 운항 전문가들이었다. 8명 중 두 명은 위원회 종반부터 참여하지 않
았고 최종 투표에서도 빠졌다. 나머지 여섯 명 중에 내인설을 지지한 사람은 변호사 1인, 조선공학 및
해양 운항 전문가 2인이었고, 외력설을 지지한 사람도 변호사 1인, 조선공학 및 해양 운항 전문가 2인
이었다. 선조위의 분열된 결론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뉴스타파>만이 선조위 종합보고서를 상세
히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다. 김성수(2018. 8. 7) 참조.
33) 필자는 항적사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관묵 교수나 <세월X>를 제작한 ‘자로’가 상호작용전문성을
획득한 시민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선체조사위원회 같은 조직에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원인
을 조사해야 했지만,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대신에 인터넷 SNS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전파에 치중했다.
134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기관과 관련 학회의 협력하에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연구
를 지속시키는 식으로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돌이켜 보면, 이런
방식의 전문적 논의와 분석은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34)
세월호 원인 조사의 경우에 이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실
현되지 못한 이유는 다중적이었다. 초기에 기술적 분석은 검찰과 법정에
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었고, 2014년에 법적 국면
과 정치적 국면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던 톱니바퀴와 비슷했다. 유가족
과 시민사회는 정치적 국면에서 배제되었고, 정부・여당 같은 정치권은
세월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판결과 기술적 결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해 비
판적인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사고 원인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만들어 냈고, 이런 설
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대각 조타에 대한 과실이 무죄 판결을 받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검찰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신뢰를 잃으면서 기술적 국면
에 당당하게 편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고 원
인에 대한 조사와 논쟁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런 과거는 ‘세월호’가
현재에도 미완인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6.결론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 규명, 책임자나 관련자의 사과와 처벌,
피해 회복과 보상,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차원에서의 갈
등, 논쟁, 공방이 오간다. 피해의 정도가 클 경우,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 상대적으로 분명할 경우, 혹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을
34) 선조위는 8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하부에 3개의 조사과를 두었고, 여기에서 많은 사무관과 조사
관들이 일을 했다. 그런데 위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에 국한되었고,
조직 구조상 조사관에게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조사에 참여하기 힘들었다(전 선조위 위원 목포해양대
학교 김철승 교수 인터뷰, 2020. 10. 23). 이런 조직 구조가 침몰 원인 규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35
경우에 법원은 이런 갈등과 논쟁이 부딪치고 해소되는 공간이 된다. 세
월호 참사는 그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검찰은 복수의 전문가 보고서들
을 인용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한 선원의 과실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렇
지만 구속된 선원을 직접 면담하거나 취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들은 선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해서 이를 과학적 언어로 재
현하고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사고 초기에 검찰과 전
문가 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구성했고, 이렇게 구성된 침몰 원인에 대한 설명은 1심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듯이, 선체가 인양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가 그렸던 대각도 선회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콜린스의 선택적 모더니즘은 시민이나 정치 집단이 기술적 국면에
개입함으로써 비전문적 판단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초기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고
따라서 시민들과 네티즌은 인터넷 토론방, SNS를 통해서 침몰 원인에
대한 수많은 설명과 이론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해석이 적어도 2014-2016년에는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시민의 개입보다 더 큰 문
제는 ‘법적 국면’이 초기의 ‘기술적 국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검
찰이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피의자의 의도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
는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데,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1) 선체가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2) 정치권의 선호가 ‘내인설’에 맞춰진 채로, 3) 조속한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정치권의 기대와 압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적
국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대각도 선회를 낳은 선원의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뀌면서, 검찰과 검찰에 자문을 했던 전문가 그룹
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논
의는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런 논의의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외력’이나 심지어 고의 침몰 같은 모종의 ‘음모’를 상정한
것이었다. 세월호에 외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의 심판
을 받아 해체되고, 외력설이나 고의 침몰설은 더 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
136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다. 이렇게 커진 영향력을 갖게 된 ‘외력설’은 2017년에 결성되어 2018년
여름까지 활동한 선조위에 이어졌고, 2018년에 결성되어 선조위가 풀지
못한 문제를 이어받아 2020년 11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참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37
참고문헌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 북콤마.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2019),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창비.
경향신문 (2014. 8. 7), 「국회 청문회서 거론된 日언론 ‘박 대통령 사생활’ 의
혹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71452201&code=9104
02, 2020. 10. 1 접속.
강정화 (2018), 『세월호 해난 참사 원인 및 대책』, 북랩.
고동현・이재열・정병은・장덕진・조병희・구혜란・김지영・김주현 (2015), 『세월호
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울(한울아카데미).
곽동기 (2014),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세월호의 진실』, 도서출판 615.
광주지방법원, 「제22회 공판조서」, (2014. 10. 7).
권경성・채지선・박주희 (2016. 10. 29) 「루머가 현실로… “누구말 믿나” 괴담
빠진 한국」,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1610290474465004, 2020. 10. 1 접속.
김덕현 (2014. 4. 17), 「"여객선 구조 한 시간만 빨랐어도 다 살았을 것"」,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
66786, 2020. 9. 30 접속.
김성수 (2015. 12. 17), 「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뉴스
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61gn9, 2020. 9. 30 접속.
(2017. 9. 15),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뉴
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CM2sD, 2020. 9. 30 접속.
(2018.08.07.), 「세월호 선조위 종합보고서 세부 분석… 사실상 “내인설
4 vs 2 외력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a_ku5,
2020. 8. 20 접속.
김승주 (2018),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적 관
점』, 책갈피.
김종엽・김명희·이영진·김종곤·최원·김도민(...)이재승 (2016), 『세월호 이후의 사
회과학』, 그린비.
김종영 (2017), 『지민의 탄생: 지식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 지성의 도전』, 휴
머니스트.
138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남궁협 (2018),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
론의 역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
론정보학보』, 제91호, 41-75쪽.
노컷뉴스 (2014. 6. 11), 「세월호 항해사 "충돌 피하려 선회"…선박 정체는?」
https://www.nocutnews.co.kr/news/4040072, 2020. 9. 30 접속.
목포MBC, 「세월호 내부 변형 최초 확인... 외력의 흔적?」, http://www.mpmbc.
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2356&sca=9%EC%8B%9C%
EB%89%B4%EC%8A%A4%EB%8D%B0%EC%8A%A4%ED%81%AC,
2020. 10. 5접속.
박기용 (2014. 4. 20), 「생존자 “7시45분에 쿵소리” 증언⋯8시 전에 사고 발
생?」,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3
760.html, 2020. 10. 2일 접속.
박서현 (2015), 「수치화되는 녹조현상, 지워지는 ‘낙동강’」, 서울대학교 자연
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철홍 (2017. 9. 26),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 감지 괴물체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6103200054, 2020.
9. 30 접속.
박현정 (2014. 7. 23),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의혹」,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7533.html, 2020. 9. 30일
접속.
사공영호 (2016),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규제연구』, 제25권,
55-90쪽.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6. 3), 「[세월호 침몰원인] 믿을 수 없는 조
사결과 1. 급변침은 없었다」, http://saesayon.org/2014/06/03/12642/,
2020. 9. 1 접속.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본권 – I』.
여운창 (2014. 4. 16), 「"사고선박 아침 8시 전부터 해상에 서 있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0416154700054? 2020.
9. 11 접속.
연합뉴스 (2014. 4. 17), 「세월호, 막판에 항로 급히 바뀌어」
https://www.yna.co.kr/view/AKR20140417178200003, 2020. 9. 31 접속.
(2014. 4. 18), 「잃어버린 구조 시간은 '9분'이 아니라 '1시간'이었
다」, https://news.v.daum.net/v/20140418143408399, 2020. 10. 1 접속.
이광호 (2014), 「남은 자의 침묵: 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
학과 사회』, 제27권, 318-341쪽.
이동욱 (2014. 10. 26), 「對角度인가, 大角度인가? 세월호 변침을 둘러싼 검찰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39
공소장 검증」, 『조갑제닷컴』, https://m.chogabje.com/board/view.as
p?cpage=0&C_IDX=58080&C_CC=AZ, 2020. 10. 10 접속.
이병천・박기동・박태현 엮음 (2016),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그날, 그리
고 그 이후』, 한울(한울아카데미).
이찬열 (2014. 5. 13),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4673567, 2020. 9. 30 접속.
이현수 (2014. 4. 20), 「“군이 사고조작?” 정부 겨냥한 근거 없는 괴담 강력 대
응」,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59&oid=449&aid=0000016153, 2020. 9. 20 접속.
인문학협동조합 (2015),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현실문화.
임남규・성유창・이상민・최보라 (2014), 「AIS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월호 사고
검토」,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49-151
쪽, 2014.06.12. 발표
전상인 (2014),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조현호 (2014. 4. 17), 「6300톤급 세월호 좌초로 좌측 선저 찢겼을 가능성」,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
o=116045, 2020. 9. 30 접속.
(2015. 12. 3), 「세월호 급변침, 조타미숙・비정상 작동도 아니라면?」,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
o=126401, 2020. 10. 3 접속.
중앙일보 (2015. 4. 17), 「[사설] 세월호 추모 거부당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https://news.joins.com/article/17607600, 2020. 9. 15 접속.
지주형 (2014),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신자유주의의 환상과 현실」,
『경제와사회』, 제104호, 14-55쪽.
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 (2016),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최인수 (2015. 11. 13), 「세월호 침몰 원인 미궁 "조타 과실 단정 못해"」,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503397, 2020. 10. 15
접속.
최효재 (2017),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와 쟁점」, 『고려법
학』, 제 87호, 117-165쪽.
토머스 S. 쿤 (2013[1962]), 김명자, 홍성욱 번역, 『과학혁명의 구조』 , 까치.
[Kuhn, S. T.,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50th Anniversary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한겨레 (2014. 5. 20), 「사월, 哀-세월호 최초 100시간의 기록」, http://www.han
140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991.html#csidxb9724ae382b4373af3b
b23ff8344370, 2020. 9. 30 접속.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2014), 『여객선 세월호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
고서』,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현재환・홍성욱 (2015), 「STS 관점에서 본 위험 거버넌스 모델: 위험분석과
사전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1호,
281-325쪽.
홍성욱 (1997), 「누가 과학을 두려워하는가: 최근 ‘과학 전쟁’(Science Wars)의
배경과 그 논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9권 제2호, 151-179쪽.
(2016),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 동아시아.
(2018),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 『과학기술학연
구』, 제18권 제1호, 63-127쪽.
해리 콜린스・로버트 에번스・고현석 번역 (2018), 『과학이 만드는 민주주의:
선택적 모더니즘과 메타 과학』, 이음. [Collins, H. and Evans, R.
(2017), Why Democracies Need Science, Polity.]
JTBC (2014. 6. 25), 「세월호 사고 당시 실제 레이더 관제 영상 입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09592, 2020.
8. 1 접속.
MBC (2014. 7. 28), 「계속 바뀌는 세월호 항적도…사고 원인, 급변침 맞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00908_30301.html,
2020. 9. 1 접속.
YTN (2014. 4. 25), 「사라진 항적 첫 확보..."1초만에 10도 급선회"」,
https://ytn.co.kr/_ln/0103_201404251904261711, 2020. 9. 1 접속.
Brown, P. (1987), “Popular Epidemiology: Community Response to Toxic
Waste-Induced Disease in Woburn, Massachusetts”,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12, pp. 78-85.
Callon, M., Lascoumes, P., and Barthe, Y. (2001), Agir dans un monde incertain.
Essai sur la démocratie technique. Paris: Le Seuil.
Collins, H. M. (1974), "The TEA Set: Tacit Knowledge and Scientific Network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4, pp. 165-186.
. (1981a), "Stages in the Empirical Programme of Relativism",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1, pp. 3-10.
. (1981b), "Son of Seven Sexes: The Social Deconstruction of a
Physical Phenomenon",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1, pp. 33-62.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41
. (1981c), "The Place of the “Core-Set’ in Modern Science: Social
Contingency with Methodological Propriety in Science", History of
Science. 19, pp. 6-19.
. (1985), Changing Order: Replication and Induction in Scientific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0), Artificial Experts: Social Knowledge and Intelligent Machines,
Cambridge, MA: MIT Press.
. (2004), Gravity’s Shadow: The Search for Gravitational Wa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10), “Elective modernism,” (unpublished document) at
sites.cardiff.ac.uk/harrycollins/files/2016/02/elective-modernism-4.doc
. (2013), Gravity’s Ghost and Big Dog: Scientific Discovery and Social
Analysi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17), Gravity’s Kiss: The Detection of Gravitational Wa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lins, H. M. and Evans, R. (2002), “The Third Wave of Science Studies: Studies
of Expertise and Exper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2, pp.
235-96.
. (2003), “King Canute Meets the Beach Boys:
Responses to The Third Wav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3, pp.
435-452.
. (2007), Rethinking Experti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lins, H. M. and Kusch, M. (1998), The Shape of Actions: What Humans and
Machines Can Do, Cambridge, MA: MIT Press.
Collins, H. M. and Pinch, T. (1993), The Golem: What You Should Know about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lins, H. M. and Sanders, G. (2007), “They Give You the Keys and Say ‘drive
It!’ Managers, Referred Expertise, and Other Expertise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Vol. 38, pp. 621–641.
Collins, H. M. and Yearley, S. (1992), “Epistemological Chicken”, in Pickering, A.
ed., Science as Practice and Culture, pp. 301-32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lins, H. M., Weinel, M. and Evans, R. (2010), “The Politics and Policy of the
Third Wave: New Technologies and Society”, Critical Policy Studies,
142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Vol. 4, pp. 185-201.
Collins, H. M., Evens, R., Ribeiro, R., and Hall, M. (2006), “Experiments with
Interactional Expertis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Vol. 37, pp. 656–674.
Epstein, S. (1995), “The Construction of Lay Expertise: AIDS Activism and the
Forging of Credibility in the Reform of Clinical Trial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Vol. 20, pp. 408-37.
Epstein, S. (2011), “Misguided Boundary Work in Studies of Expertise: Time to
Return to the Evidence”, Critical Policy Studies, Vol. 5, pp. 323-328.
Fiorino, D. (1990), “Citizen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Risk: A Survey of
Institutional Mechanism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Vol.
15, pp. 226–243.
Franklin, A. (1994), “How to Avoid the Experimenter's Regress”,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 25, pp. 463-503.
Funtowicz, S., and Ravetz, J. (1993), “Science for the Post-normal Age”, Futures,
Vol. 31, No. 7, pp. 735-755.
Giles, J. (2006), “Sociologist Fools Physics Judges”, Nature, Vol. 442, No. 7098, p. 8.
Hollinger, D. (1995), “Science as a Weapon in Kulturkampfe in the United States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Isis, Vol. 86, pp. 440-454.
Huxham, M., and Sumner, D. (1999), “Emotion, Science and Rationality: The Case
of the Brent Spar”, Environmental Values, Vol. 8, pp. 349-368.
Jasanoff, S. (2003), “Breaking the Waves in Science Studie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3, pp. 389-400.
Kim, Y., S., Seo, M-G., and Lee, J-H. (2019), “Numerical Simulation of Sewol
Ferry Capsize”, Proc IMechE Part M: J Engineering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Vol. 233, No. 1, pp. 186–208.
Krimsky, S. (2015), “An Illusory Consensus behind GMO Health Assessment”,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Vol. 40, pp. 883-914.
Latour, B. (1993),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Laudan, L. (1982). “A Note on Collins’s Blend of Relativism and Empiricism”,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2, pp. 131–132.
Shwed, U., and Bearman, P. S. (2010), “The Temporal Structure of Scientific
Consensus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5, pp.
817-840.
Turner, S. (2001), “What is the Problem with Experts?”, Social Studies of Science,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43
Vol. 31, pp. 123-149.
Wehrens, R. (2019), “Waves, Owls and Boundaries: How to Think About Science
and Democracy in the ‘Post-Truth’-Era?,” Science as Culture, Vol. 28,
pp. 120-124.
Wynne, B. (1989), “Sheepfarming after Chernobyl: A Case Study in Communicating
Scientific Information”,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 31, pp. 10-39.
. (2003), “Seasick on the Third Wave? Subverting the Hegemony of
Propositionalism”,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3, pp. 401-417.
. (2008), “Elephants in the Rooms Where Publics Encounter ‘Scie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17, pp. 21-33.
<온라인 문헌들>
박종대 (2015. 4. 28), 「사고의 원인은 밝혀 졌나요」, https://blog.naver.com/suhy
eon1053/220347586386, 2020. 10. 3 접속.
조갑제닷컴 (2014. 5. 29), “檢警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세월호 침몰과 선장
도망 全과정”,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5979&
C_CC=AZ, 2020. 10. 2일 접속.
한국청년연대 (2014. 6), “세월호 참사 밝혀야 할 10대 의혹”(포스터),
http://sewolho416.org/671, 2020. 10. 2 접속.
항적사수 (2015. 6. 7), “레이다로 추정한 세월호 항적 - 컨테이너의 딜레마”,
https://m.blog.naver.com/actachiral/220382335666, 2020. 10. 1 접속.
항적사수 (2016. 1. 24), “감사원 보고서를 감사한다”, https://m.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actachiral&logNo=220606903295&proxyReferer=https:%
2F%2Fwww.google.com%2F, 2020. 10. 1 접속.
항적사수 (2017. 9. 26), “컨테이너 레이다 탐지 실험”, https://m.blog.naver.com/ac
tachiral/221105784968, 2020. 10. 1 접속.
JTBC News (2014. 6. 25) “[단독] 세월호 사고 당시 실제 레이더 관제 영상 입
수”, https://youtu.be/4zKsg2LocBQ, 2020. 9. 2 접속.
하늘티 (2014. 4. 17), “세월호 침몰 최초 보도 뉴스는 오전 7시 30분경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
474850 이 자료는 현재 https://m.cafe.daum.net/sisa-1/paqp/105?listURI
=%2Fsisa-1%2Fpaqp 에서 볼 수 있다. 2020. 9. 31 접속.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했다?? (논란중)” (2014) https://www.instiz.net/pt/2153912,
2020. 10. 1 접속.
144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스크랩] 세월호 폭발에 의한 침몰? - 화상환자,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2014. 5. 4), http://blog.daum.net/taxitriton/995, 2020. 10. 1 접속.
“[스크랩] 세월호 3등항해사 박한결 잠수함 보았다고 법정에서 증언!!!!” (2014.
11. 10), http://blog.daum.net/neo1000g/3969383, 2020. 9. 30 접속.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는 집단자살 이단종파 오대양사건 가족!!!” (2014. 4. 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
=2693769 이 자료는 현재 http://m.blog.daum.net/yj5288/16517442에
서 볼 수 있다. 2020. 9. 20 접속.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2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23일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145
An Analysis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capsize from the perspective of ʻʻelective modernismʼʼ
Sungook HONG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normative problem of who should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capsize, looking into the debate
over it during the past six years. This paper will evaluate this subject in the light
of “elective modernism,” a framework proposed by STS scholars such as Harry
Collins and Robert Evans. The controversy promoted by technoscience
encompasses debates on both political and technical topics, and elective
modernism requires that discussions on technical topics be limited to two groups
of experts—contributory experts and interactional experts.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he social debate on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capsize is an example
that simultaneously reveals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lective modernis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here existed a “legal phase”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and political
phases, and this legal phase greatly influenced the technical phase. This paper
will show that by considering this process, not only can the framework of elective
modernism dealing with technoscientific controversy be supplemented, but it is
also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why the debate over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sinking did not reach a consensus.
Key terms❘Sewol Ferry, Cause of Sinking, Elective Modernism, Harry Collins, Robert Evans,
Internal Cause Theory, Open-Ended Proposal, Legal Phase
146 과학기술학연구 제20권 제3호 101-146(2020)
You might also like
- 주자와 스피노자는 왜 비슷한가Document32 pages주자와 스피노자는 왜 비슷한가kspcauteNo ratings yet
- 홉스 『리바이어던』 PDFDocument249 pages홉스 『리바이어던』 PDF이강식No ratings yet
- 플라톤향연Document122 pages플라톤향연sensekangNo ratings yet
- 통합 역사학대회 한국과학사학회 과학사 분과 자료집 원고Document42 pages통합 역사학대회 한국과학사학회 과학사 분과 자료집 원고PT TextectonicNo ratings yet
- 오항녕 - 역사와기록Document19 pages오항녕 - 역사와기록Sofia GonzálezNo ratings yet
- 2023 라투르와 가이아의 시각화, 그리고 과학과 예술Document36 pages2023 라투르와 가이아의 시각화, 그리고 과학과 예술홍성욱No ratings yet
- 1 2Document2 pages1 2k4mqrvypfzNo ratings yet
- 07 À ºÀÈñDocument31 pages07 À ºÀÈñYoung Sue HanNo ratings yet
- ANTDocument4 pagesANTSang Hee HanNo ratings yet
- 논술 강의자료5Document15 pages논술 강의자료5김민성No ratings yet
- ZH PhilDocument56 pagesZH Phil홍쓰No ratings yet
- 일본 미디어사 연구 지형의 탐색 윤상길 정수영 - 언론정보연구 - 53 - 2Document54 pages일본 미디어사 연구 지형의 탐색 윤상길 정수영 - 언론정보연구 - 53 - 2Hasumi YasujiroNo ratings yet
- 강의자료5 -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탄생) - PDFDocument6 pages강의자료5 -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탄생) - PDFSanghyeon ParkNo ratings yet
- Kci Fi001784151Document36 pagesKci Fi001784151doyun4729No ratings yet
- (국기원) 2006-02-01-00 태권도 역사 정신에 관한 연구Document78 pages(국기원) 2006-02-01-00 태권도 역사 정신에 관한 연구Casey RybackNo ratings yet
- Broadcast Seminar Syllabus 2020 0803Document6 pagesBroadcast Seminar Syllabus 2020 0803Nhi ThanhNo ratings yet
- WWW Dbpia Co KRDocument52 pagesWWW Dbpia Co KR이현No ratings yet
- 전재호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Document33 pages전재호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허정민No ratings yet
- UntitledDocument27 pagesUntitled김윤하No ratings yet
- 논술 강의자료2Document15 pages논술 강의자료2김민성No ratings yet
- 沈裕昌:〈宇宙技術論批判:與許煜商榷〉Document34 pages沈裕昌:〈宇宙技術論批判:與許煜商榷〉uiuiandlaoNo ratings yet
- 생화학1 과제1 201811026 김성하Document4 pages생화학1 과제1 201811026 김성하김성하No ratings yet
- 한국전쟁과 전염병 연구 어떻게 볼신동원 - 기억과전망 - 2020년 겨울호 43ȣDocument23 pages한국전쟁과 전염병 연구 어떻게 볼신동원 - 기억과전망 - 2020년 겨울호 43ȣbiggerocketNo ratings yet
- 7ê °ì Ê ©ì° Ì Ë Í Ì Í Ì Ë° Ì Â Ì Ê Ì Â Ê° Ë? Ì Ì ÌDocument28 pages7ê °ì Ê ©ì° Ì Ë Í Ì Í Ì Ë° Ì Â Ì Ê Ì Â Ê° Ë? Ì Ì Ìwpg4x2df9zNo ratings yet
- KeywordsDocument33 pagesKeywords초원니No ratings yet
- Kci Fi002862165Document16 pagesKci Fi002862165민성김No ratings yet
- 학문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 학문연구의 가능성과 전망 (서과연 2008)Document18 pages학문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 학문연구의 가능성과 전망 (서과연 2008)wltjsgh996No ratings yet
- 2004핸드북-11회 1Document7 pages2004핸드북-11회 1wltjsgh996No ratings yet
- 과학사 교안 1Document15 pages과학사 교안 1김채호No ratings yet
-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May Fourth Movement, Cultural Conservatism, Wholesale Westernizarion, Hsin Qing-Nian MagazineDocument41 pagesThe New Culture Movement, The May Fourth Movement, Cultural Conservatism, Wholesale Westernizarion, Hsin Qing-Nian MagazineskyeylakeNo ratings yet
- 2023 SF 미래예측인가 사고실험인가Document43 pages2023 SF 미래예측인가 사고실험인가홍성욱No ratings yet
- Kyobo 10445376Document35 pagesKyobo 10445376fuiopNo ratings yet
- 양-질 구분을 다시 생각한다Document31 pages양-질 구분을 다시 생각한다김덕준No ratings yet
- 2022 과학기술학은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Document24 pages2022 과학기술학은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홍성욱No ratings yet
- 전기 자동차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Document15 pages전기 자동차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hyunyoung256No ratings yet
- 플라톤 철학의 선-형이상학적인 구조Document31 pages플라톤 철학의 선-형이상학적인 구조pleasantsongNo ratings yet
- 2024-1Document3 pages2024-182r2myk86qNo ratings yet
- 김상준의 붕새의 날개를 읽고Document8 pages김상준의 붕새의 날개를 읽고hjchoi68No ratings yet
- 2021년 1학기 주제탐구세미나1Document7 pages2021년 1학기 주제탐구세미나1Alex KimNo ratings yet
- 2021년 1학기 주제탐구세미나1-복사 (문명)Document7 pages2021년 1학기 주제탐구세미나1-복사 (문명)Alex KimNo ratings yet
- 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권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163-199 쪽.Document37 pages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권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163-199 쪽.이문석No ratings yet
- 2012 년 2학기Document28 pages2012 년 2학기Francisco RJNo ratings yet
- 처널리즘Document4 pages처널리즘songjina0102No ratings yet
- 05 (61집1호) 인문사회 신용하-편집 (최종)Document114 pages05 (61집1호) 인문사회 신용하-편집 (최종)윤기연No ratings yet
- 논문Document46 pages논문이채령[학생](국제대학 국제학과)No ratings yet
- 글쓰기 12주차 1차시자료 (인용)Document20 pages글쓰기 12주차 1차시자료 (인용)김재형No ratings yet
- Postcolonial Feminist Theology in KoreaDocument21 pagesPostcolonial Feminist Theology in KoreaHannah LiaoNo ratings yet
- Inmun v60 237Document31 pagesInmun v60 237이현No ratings yet
- The Enthusiasm Provoked by Lim Soo Kyung PDFDocument52 pagesThe Enthusiasm Provoked by Lim Soo Kyung PDFAndra MacMastersNo ratings yet
- 2,3 ( - 2023111057)Document2 pages2,3 ( - 2023111057)kimyu2532No ratings yet
- 2018학년도서강대학교모의논술자료집 인문계열 (경제경영)Document7 pages2018학년도서강대학교모의논술자료집 인문계열 (경제경영)ᄋᄃᄋNo ratings yet
- Week 02Document36 pagesWeek 02애정의온도No ratings yet
- 기계가 된 몸과 현대 건축의 탄생 (임석재) (Z-Library)Document544 pages기계가 된 몸과 현대 건축의 탄생 (임석재) (Z-Library)catarinaNo ratings yet
- Kci Fi001800356Document40 pagesKci Fi001800356주인삑No rating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