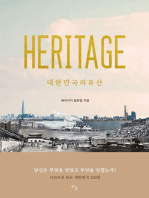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Ê Ì, Ê °ì, Ì Ì, Ë Ì
Ê Ì, Ê °ì, Ì Ì, Ë Ì
Uploaded by
djdisopsd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2 views3 pagesOriginal Title
ê³ ì ,êµ°ì,ìì¸,ë
¼ì´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0 ratings0% found this document useful (0 votes)
2 views3 pagesÊ Ì, Ê °ì, Ì Ì, Ë Ì
Ê Ì, Ê °ì, Ì Ì, Ë Ì
Uploaded by
djdisopsd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Available Formats
Download as PDF, TXT or read online from Scribd
You are on page 1of 3
<고전 함께 읽기>
1. 군자와 대비되는 소인의 성향과 특징
-학이, 위정, 이인, 안연, 자로, 헌문, 위령공, 계씨, 양화, 자장편 글을 참고하여
논어의 현존본은 학이편부터 요왈편까지 총 20편, 480장으로 이뤄져있다. 그렇다
면 논어의 각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군자와 소인은 누구를 뜻하
는 말일까.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제 1편 학이편은 논어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논
어의 첫 문장을 통해 우리는 ‘배움의 기쁨, 벗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울해하지 않는 모습’을 군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배움을 통해 군자는 자신을 수양한다. 그 이유는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수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도 아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 군자는 배움의 기회
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를 뜻한다. 소인은 그에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논어 제 2편 위정편에서는 “효(孝), 경(敬), 신(信), 용(勇)이 백성을 다스리는 덕”
이라고 설명했다. 성현과 군자는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군자가
백성을 교화하고 또 풍속을 높이려면 반드시 배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반
대로 소인은 남을 다스릴 줄 모르는 부덕한 이들을 말한다.
네 번째 편은 이인편이다. 인은 가장 큰 선행을 말한다. 군자가 인을 체득하면 필
연적으로 예악을 행한다고 봤다. 반대로 소인은 선행을 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 또
인을 체득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 12편 안연편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안연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자는 인정의 도리를 밝히고 그 인정을 달성하는 길을 걷는다. 또
군신과 부자가 지켜야하는 예, 미혹을 분멸하고 옥사를 처결하고, 학문과 덕행 등을
중요시 여긴다.
반대로 소인은 이러한 벼슬에 나가는 기본 단계를 거칠 능력, 인품, 성품이 되지
모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제 13편 자로편은 총 30장으로 되어 있다. 주로 전반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풀어져 있다. 그 다음 후반에는 정치, 가정, 도덕, 위정자, 정치에 참여하려는 선비
들이 지켜야 할 덕 등을 다뤘다.
“선인이나 군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을 교화하는 인정과 효제에 대한 글
이 많다. 특히 중용의 도를 지키고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수신과 치국의 기본
이다”고 말했다.
소인은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용을 지킬 줄 모른다. 또 윤리 도덕 등
의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다.
제 14편 헌문편은 주로 삼황과 이패의 역사적 흔적과 여러 명의 제후, 대부들의
행적이 담겨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군자의 특징은 ‘인을 실천하고 염치를 알고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인은 인을 실천할 주 모르고 염치도 모르며 자신을 수양하는 일을 게을
리하고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하려하지 않는다.
제15편인 위령공편은 공자가 겪은 여러 불우한 일들을 적혀있고 그런 일들로 인
해 느낀 한탄과 감회 등이 적혀있다. 소인은 세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들을 뜻할
것이다.
제 16편 계씨편은 논어 중에서도 체재가 가장 특이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편과
다른 점은 ‘자왈’을 계씨편에서는 ‘공자왈’이라고 말한다. 또 ‘삼우, 삼요, 삼연, 삼
계, 삼외’처럼 숫자를 맞춘 장이 많다.
군자를 모시면서 범하기 쉬운 3가지 잘못이 있다. “말할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말
하는 것을 조급하다라고 한다. 말할 차례가 됐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속을 숨긴
다고 하는 것이다.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은 눈치가 없다는 의미다”
이 글을 통해 생각해본 소인은 ‘조급한 성격’, 그리고 ‘속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
또 ‘눈치가 없는’ 이들을 뜻할 것이다.
제 17편 양화의 주된 내용은 세상이 무도한 것을 한탄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혀있다.
“나라의 대신들뿐 아니라 가신들도 타락했다. 이에 세상이 흉악하다” 즉, 소인은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흉악한 일을 벌이는 이들이다.
제 19편인 자장편은 공자의 뛰어난 제자들의 말을 추린 내용이다. 공자의 제자들
중 자하의 말이 가장 많이 적혀있고 그 다음은 자공, 증자다.
자장이 벼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공자는 “많이 듣되 의심스러
운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며 의심스
러운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삼가서 행하면 뉘우칠 일이 적을 것이다. 또 말에 허
물이 적고 뉘우칠 행동이 적다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해 생각해본 소인의 특징은 많이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삼가서 하지
않는다. 또 의심스러운 일에 집중하고 또 뉘우칠만한 행동을 자주 범한다. 그리고
말 실수가 많다.
지금까지 논어를 통해 군자와 비교, 대비되는 소인의 성향과 특징을 살펴봤다. 소
인은 배움을 게을리 한다. 또 남을 다스릴 줄 모르는 부덕한 이들이다. 선행을 할
그릇이 되지 못하고 인을 체득하기도 어렵다. 벼슬을 얻을 능력, 성품, 인품이 되지
못하다.
세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 조급한 성격에 속을 숨기는
경향이 많고 또 눈치가 없다. 그리고 후회할 행동을 자주 하며 말 실수가 잦다.
2. 내가 생각하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
누구나 소인이 되기보다는 군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군자는 어떤
이들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소인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할 줄 아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논어에서 말한 ‘학’, 즉 배
움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잘못을 개선하고 다시 같은 실수
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자는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은 벼슬을
얻고 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이들이다. 반면 소인은 자신밖에 모르며
자신에게 좋은 행동만을 한다.
또 논어에서도 강조됐듯 사람의 ‘기세’가 중요하다. 능력, 성품, 인품 등이 훌륭한
이들이 바로 군자이며 소인은 남에게 칭송받을만한 덕망이 없다.
이러한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깨달은 바
를 실천할 줄 안다. 반면에 소인은 게으르고 좋은 일을 하기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
다.
3. ‘들어가는 말’ 핵심 요지 정리
-이인편, 아름다운 공동체
한 인간이 인을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공동체 전체가 인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이인편에서 나온다. 이 말을 통
해 인을 고민하고 실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봉길 의사다. 그는 편지를 통해 동
생에게 “장부가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그것
을 실행한다. 부탁하니 부모님을 공양해라. 효가 나라 사랑의 근본이다”고 말한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짧은 삶을 살았던 윤봉길이 논어를 읽고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을까. 모두가 읽는 논어는 같은 책에 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이는 논어를 읽
고 나라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논어의 네 번째 편인 이인편에서는 인을 강조한다. 여기서 인이란 가장 큰 선행을
뜻하는 말이다. 공자는 군자가 인을 체득하면 필연적으로 예악을 행한다고 설명했
다. 반대로 소인은 인을 체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선행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
는 사람들일 것이다.
스물 다섯 살. 상해에서 일본군 장교들이 모여 있던 단상위로 폭탄을 투척했다. 그
는 결국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형이 행해져 순국했다.
You might also like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 일하며 성장ᄒDocument199 pages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 일하며 성장ᄒkai kaiNo ratings yet
- Ebs 개념완성 통합사회Document444 pagesEbs 개념완성 통합사회9p4km7zqqkNo ratings yet
- 0Document72 pages0Woojin ER ByunNo ratings yet
- Koreaculture HighDocument199 pagesKoreaculture HighLinhLinh21No ratings yet
- 중간고사 대체 과제 시사봉Document1 page중간고사 대체 과제 시사봉sofia409752No ratings yet
- 시사봉 과제 최종본Document3 pages시사봉 과제 최종본sofia409752No ratings yet
- 1-1. (인문체육계) 2024 문제지 - 최종Document3 pages1-1. (인문체육계) 2024 문제지 - 최종conandoil86No ratings yet
- 인간과사회2 2학년7반 박에스더 이솔지 황하영 신호진Document5 pages인간과사회2 2학년7반 박에스더 이솔지 황하영 신호진신호진No ratings yet
- 0905좌담회어서홈페이지강의Document4 pages0905좌담회어서홈페이지강의bagminji367No ratings yet
- 2022 1 9 ( )Document2 pages2022 1 9 ( )mdfh31f17No ratings yet
- 제목없는 문서-1Document2 pages제목없는 문서-1a01031167714No ratings yet
- 20130Document2 pages20130a28224188No ratings yet
- ( ) 7Document93 pages( ) 7최용석No ratings yet
- 20년 고1 11월 학평 (경기) 국어 -문제Document16 pages20년 고1 11월 학평 (경기) 국어 -문제bmgqkqh2No ratings yet
- 5 (1) 소단원평가Document7 pages5 (1) 소단원평가ksh56002455No ratings yet
- 06. 2020 단원별 기출문제 정리자료 (윤리와사상)Document97 pages06. 2020 단원별 기출문제 정리자료 (윤리와사상)ydd5260No ratings yet
- 2019모의논술 문제지 (인문체능계)Document3 pages2019모의논술 문제지 (인문체능계)seooNo ratings yet
- 고등독서교과서 - (138~17) OK.indd 138 18. 11. 27. 오 3:09Document87 pages고등독서교과서 - (138~17) OK.indd 138 18. 11. 27. 오 3:09lbuildeuNo ratings yet
- 2022 중등1차 도덕윤리 전공ADocument5 pages2022 중등1차 도덕윤리 전공AHSeok YNo ratings yet
- (요약본) 맹자Document5 pages(요약본) 맹자Ohkyun KwonNo ratings yet
-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생활과윤리 (해설)Document8 pages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생활과윤리 (해설)ssandy1223No ratings yet
- 군주론 15 - 16장 내용 요약Document1 page군주론 15 - 16장 내용 요약rla0010101No ratings yet
- 명작감상기말202200165김하늘Document3 pages명작감상기말202200165김하늘김하늘No ratings yet
- 03 내가 좋다 하고~,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분기Document13 pages03 내가 좋다 하고~,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분기tooopyooo001No ratings yet
- 2023 일취월장 특강 국어 학습지Document27 pages2023 일취월장 특강 국어 학습지eeheehee00No ratings yet
- 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S-TOPIK) (S-TOPIK) (S-TOPIK) (S-TOPIK)Document24 pages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일반 한국어 (S-TOPIK) (S-TOPIK) (S-TOPIK) (S-TOPIK)Thúy NguyễnNo ratings yet
- 3학년 1학기 독서활동 기록카드Document2 pages3학년 1학기 독서활동 기록카드오세훈No ratings yet
- 002-논리와 비판적 사고-텍스트Document34 pages002-논리와 비판적 사고-텍스트수민하늬No ratings yet
- 허생전Document22 pages허생전kimhyun0510No ratings yet
- 1 3주차 강의.hwpxDocument21 pages1 3주차 강의.hwpx이길현No ratings yet
- 윤사 교과서 자습서 PDFDocument210 pages윤사 교과서 자습서 PDFkimbokyung2007No ratings yet
- book 201904 완자 윤리와사상 정답친해Document72 pagesbook 201904 완자 윤리와사상 정답친해kjw060301No ratings yet
- 완자 윤리와사상 정답친해Document72 pages완자 윤리와사상 정답친해eiaodvneNo ratings yet
- 1.2024-1학기 사회의탐색 독후감과제 대상 도서Document15 pages1.2024-1학기 사회의탐색 독후감과제 대상 도서k616108No ratings yet
- 「雲英傳」과 「洞仙記」 속 惡人 탄생의 의미Document22 pages「雲英傳」과 「洞仙記」 속 惡人 탄생의 의미isaacmason33No ratings yet
- ②-2 최종마무리Document16 pages②-2 최종마무리xcgfb9sjfbNo ratings yet
- 2022120141 - 2024학년도 바탕 0회 모의고사 - 문제지 및 해설지Document72 pages2022120141 - 2024학년도 바탕 0회 모의고사 - 문제지 및 해설지ac30923No ratings yet
- )Document4 pages)fd8v649prpNo ratings yet
- 염불일문심입 본문 PDFDocument92 pages염불일문심입 본문 PDF순수정토No ratings yet
- 병아리 시즌2 윤사 (1회)Document8 pages병아리 시즌2 윤사 (1회)sxb1n15No ratings yet
- 1차시 문제 모음Document8 pages1차시 문제 모음4h47yxfywzNo ratings yet
- 佛法導論 완성본Document101 pages佛法導論 완성본원왕생願往生No ratings yet
- 장애학, Why & What - - 네이버 블로그Document64 pages장애학, Why & What - - 네이버 블로그Yoohyun JungNo ratings yet
- (시즌2-2-1) (5.4~5,8) (교재미참자) 소설문학 개념 4강 + 심화 독해1 5강Document37 pages(시즌2-2-1) (5.4~5,8) (교재미참자) 소설문학 개념 4강 + 심화 독해1 5강gustn1720No ratings yet
- 시사봉 중간고사 대체 과제 워드Document1 page시사봉 중간고사 대체 과제 워드sofia409752No ratings yet
- 2020Document4 pages2020sky0039kNo ratings yet
- 부사관 시험 면접 준비 (육군 기준) 재구성 재편집 자료.PDF2020Document8 pages부사관 시험 면접 준비 (육군 기준) 재구성 재편집 자료.PDF2020김도훈No ratings yet
-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사상 문제지Document4 pages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사상 문제지gimminseo5008No ratings yet
- 3주차 (광역주제 구체화 하기)Document2 pages3주차 (광역주제 구체화 하기)qwerqqe3No ratings yet
-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Document98 pages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ysm202005No ratings yet
- 20세기 한국에서 '청년'은 무엇이었나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Document62 pages20세기 한국에서 '청년'은 무엇이었나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이창하No ratings yet
- 동서양고전으로 시작하는 인문교육 워크시트 (탑재용)Document164 pages동서양고전으로 시작하는 인문교육 워크시트 (탑재용)parksoonkyo7No ratings yet
- Jcos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윤리와 사상Document60 pagesJcos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윤리와 사상이상윤No ratings yet
- Konspekti DI KOREISTIKADocument4 pagesKonspekti DI KOREISTIKADaniel GatevNo ratings yet
- 2023 1 3Document4 pages2023 1 3rt82zmtt99No ratings yet
- 고1 2023년 03월 통합사회Document4 pages고1 2023년 03월 통합사회hyeonjung2229No rating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