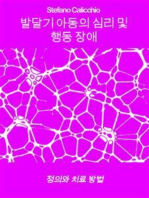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윤별 Learning Log 3
윤별 Learning Log 3
Uploaded by
BBB YOriginal Title
Copyright
Available Formats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Available Formats
윤별 Learning Log 3
윤별 Learning Log 3
Uploaded by
BBB YCopyright:
Available Formats
Learning Log – Week 3
Name – 윤별
Student Number -20190098
Content – Chapter2. First Language Acquisition (2)
1.What I Learned
⑴ 모국어 습득의 특성
-babbling: 처음은 옹알이
-telegraphic utterances: 18 개월 정도 두 세 단어로 필요한 것들 말하는 것
-chattering : 세 살 정도에는 수다쟁이. 많은 언어들의 input 을 이해하며 다양한 표현들이나 길어진
문장들 생성 가능, 쉬지 않고 대화 가능. 창의성도 돋보임.
-school age : 이러한 유창성과 창의성은 만 6 세까지 더욱 발달. 복잡한 구조나 그들의 어휘를
확장시킨 것을 내재화하면서. 또한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면
안되는지도 배움. (사회적인 기능을 익힘.)
? 그렇다면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⑵ Theories of First Language Acquisition.
①Behavioral Approach 행동주의적 접근
*Tabula rasa – clean state bearing no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world or about language.
*언어습득 과정(변화) – emitted or stimulated response that is reinforce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linguistic attempts form the child.
*stimuli – response: verbal behavior (Effective language behavior is seen as the production of
desired responses to stimuli.) 자극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올바른 언어행동이다.
+comprehension 에도 적용은 되나, publicly 관찰은 (X) / 이해도를 확인하려면 맥락과 비언어적
행동을 봐야 함. 행동주의자들은 적절한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에 대한 이해도를 입증할 수 있다 주장.
그리고 강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언어적 의미를 내재화 한다고 함.
*Skinner’s Operant conditioning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음)
-초기의 언어 습득의 행동주의적 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
-Operant Conditioning (조작적 조건화)
[response or operant (imitation) – reinforcement(강화)에 의해서 유지. - 조건화는 강화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짐. over repetition- habitualizaiton(조건화, 습관화)]
*언어적 행동은 결과에 의해 통제됨. 긍정적인 rewarding- 강화되고, 빈번도도↑
부정적인 벌 혹은 강화가 부족하면, 결국 사라짐.
-조작적 조건화 적용한 교수법 – Teaching Machine and Programmed learning
*Challenges to Behavioral Approach (60 년대에 비판: 언어발달, 습득 능력, 언어의 추상적인 본질
의미 잘 설명 X)
-외부적 요인만 너무 강조함. (강화 보상과 같은 외적인 것.)
-학습자 스스로에 대한 관찰, 고려를 간과(internal factors)
-모방의 역할을 너무 강조 : 모방이 정말로 언어습득에 필수적인가?
-cannot use novelty of language use (참신함) / 그렇다면 아이들이 한번도 쓴 적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창의성은 어른이 되어서 까지도 이어짐.
*Mediation theory (Osgood 행동주의적 이론을 확장시키기 위한 심리학자들의 이론 중 하나 /
보완하기 위해 등장)
-언어적 자극은 중재적인 반응 이끌어낸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 의미를 자지 자극인 표정적인
매개의 과정
-but, 언어의 추상적 본질인 의미 발화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too much mentalism
⇒ 행동주의를 옹호하였으나, 인지주의적 관점이 나와 버림.
②The Nativist Approach (생득주의적 접근, 선천적 접근)
-언어습득은 innately determined : 언어를 체계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남.
-아이들은 우리 주변 언어의 체계적 유전학적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남.
-이러한 생득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 언어의 구조 내면화 할 수 (O)
*LAD – 인간의 생득적인 언어지식 (어린이들이 복잡한 규칙들로 이루어진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단순히 모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LAD 다.)
*Universal Grammar
-보편적인 언어규칙이 적용되는 언어체계. 의문문 부정문 형성, 언어순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보편 체계.
*Pivot grammar (언어습득 초기에 이루어짐 telegraphic utterances 단계에서 일어남.) /촘스키↕
Sentence = (pivot word) + (open class)/(주축언어)+(열린 품사)
Ex) my cap – 한문장으로 인식. My 를 pivot word 로 cap 은 open class. 이때의 cap 은 명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 하기도 함. 모자가 떨어졌다. 모자 씌워주세요. 등
*Challenges to Nativist Approach: 보이지 않고, 관찰할 수 없는 아동 언어 발달(언어체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
·Nativist : serial(수직적) 한가지 문법 규칙이 뇌의 신경 한 곳에만 수직적으로 연결 되어있다.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 : 하나의 정보를 다양한 관심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분포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된다. Ex) 단어 하나 읽을 때 단의 모양 단어간 연결의 의미, 통사 구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병렬적으로 구분한다.
·Connectionism 뇌의 신경들은 복합적인 연결을 형성한다. 경험은 특정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배움으로
이끈다.
Ex) [go-went (쉽게 배움)], [ go -goed ‘ed’ connection (이 규칙적인 문법을 배움.)] → goed 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두 개념을 다 기억함.
⇒ 이런 인식의 변화가 nativist 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문법 규칙을 단순히 배웠다~ 보다는
동사의 과거 형식과 기능 상이에서 ‘연관(connection)’을 배운 결과라고 생각함. (인지작용에서의
뉴런의 활동에 관한 것.)
*Emergentism (관찰이 가능한 언어 수행, 신경언어학적인 구성요소 간의 식별관계에 주목을 했음)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언어가 가진 복잡성은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발달과정이 있는데,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복잡한 언어 습득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의 신경계안에 다양한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는 connection 들이 있는데 이것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억제를 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다양한 모습들이 구현이 됨.
-nativist 들의 언어 연구는 지나치게 관념 주의적일 수 있다고 비판.
③ -⑴ Functional Approach: Cogni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Bloom 은 pivot grammar 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비판.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는
관계를 도추해 나가야 한다.
-아이들은 어휘순서가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는 구조를 배운다.
-Piaget 전반적 인지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
-Slobin 의미적 학습이 인지발달에 달려있음. 구조적 복합성(생득주의)보다는 의미적 복합성에 따라
언어 학습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기능적 형식적 측면 둘 다.
-기능적 측면: 생득적인 인지적 스키마 + 이것과 상호작용하는 개념, 의사소통의 발달에 의해서 언어
발달 조절
-형식적 측면: 발달은 지각, 정보처리능력, 선천적 문법 스키마의 성장과 함께 언어 발달 조절.
⇒ 모국어 습득 연구는 언어 기능에서의 규칙형성, 언어의 형태와 기능 간의 관계규정 알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③-⑵ Functional Approach: Social Interac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아이의 언어습득 - 인간 행동의 사회적 체계가 작동법 사이의 상호작용
-담화적 수준에서 기능에 중점
2.What I Realized
· 아이들의 언어 수행능력에서 production 보다 comprehension 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제껏 나도 그랬으니 남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과, 대부분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더 많이 시켜서 당연히 production 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comprehension 과 production 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니,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읽게 하고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연기를 하는 영어연극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야기의 인물에 공감을 잘하고 동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연극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production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독후감의 형태를 빌려 그날 읽은
파트에서의 주인공의 기분을 작성하는 활동도 정규 수업으로 넣어 진행한다면 어린 아동들도
효과적으로 언어 수행의 모든 부분을 잘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What I Wonder
-Universals: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습득하는 같은 방식이 있고, 언어마다 가장 깊이
들어가보면 모든 언어를 관통하는 보편적 심층 구조가 있을 것’ 이라는 파트는 연구분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인 영어도
그렇다. 한글-영어 번역문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원문을 보더라도 그 문장의 복합성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닌 문장구조를 분석하고 있을 때가 많다. 만약 정말로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층 구조가
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외국어이기 때문에 낯선 단어와, 다른 어휘 순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겠지만, 단어의 의미를 알아도, 그 문장 구조를 완벽히 숙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속에 물음표가 맴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듯 싶다.)
-언어수행에서 아이들은 production(Speaking/Writing)보다는 Comprehension(Listening/Reading)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모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은 음성학적 코드를 훨씬 많이
따라한다고 했다. 나의 의문점은 이것이다. 아이들이 모방을 많이 하는 만큼 언어 수행에도(학습
시든, 평상 시든) 더 자주 일어나는 그 음성학적 모방이 즉, Speaking 이 언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아이들 개개인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 인가?
You might also like
- 맞춤한국어1 교사용지침서Document130 pages맞춤한국어1 교사용지침서kkumbonalda100% (4)
- (창비) 2015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Document248 pages(창비) 2015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이연수100% (1)
- 한국어교수법Document13 pages한국어교수법Ileana CosanzeanaNo ratings yet
- 1 1 제1과Document32 pages1 1 제1과Hoàng LinhNo ratings yet
- Material PTKR 5Document81 pagesMaterial PTKR 5Bruna M Sette100% (2)
- Material PTKRDocument77 pagesMaterial PTKRBruna M SetteNo ratings yet
- Material PTKR 3Document77 pagesMaterial PTKR 3Bruna M SetteNo ratings yet
- 윤별 Learning Log 2Document5 pages윤별 Learning Log 2BBB YNo ratings yet
- 윤별 Learning Log 4Document4 pages윤별 Learning Log 4BBB YNo ratings yet
- Learning Log 12Document3 pagesLearning Log 12BBB YNo ratings yet
- Learning Log 5Document4 pagesLearning Log 5BBB YNo ratings yet
- 7Document9 pages7q87vfmzhqhNo ratings yet
- 언어발달지도사_박성희_예상문답Document14 pages언어발달지도사_박성희_예상문답gypsophila ahnNo ratings yet
- 유아언어교육 1강 강의록-1Document42 pages유아언어교육 1강 강의록-1Jessica Jeongah ChoiNo ratings yet
- 유아언어교육 1강 강의록Document42 pages유아언어교육 1강 강의록Jessica Jeongah ChoiNo ratings yet
- 이필상 (2014) - 동화를 활용한 말놀이 학습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5 (2), 67-85.Document19 pages이필상 (2014) - 동화를 활용한 말놀이 학습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5 (2), 67-85.고이경ig kNo ratings yet
- 영어교수법-9주차 강의교안Document101 pages영어교수법-9주차 강의교안박하향No ratings yet
- 한국 아동의 단계별 중국어 리터러시 교수 관련 제문제Document8 pages한국 아동의 단계별 중국어 리터러시 교수 관련 제문제taehyung kimNo ratings yet
- ( )Document248 pages( )jjk65300No ratings yet
- marika 초기 언어 습득Document7 pagesmarika 초기 언어 습득MarikaNo ratings yet
- 1. 언어본질Document3 pages1. 언어본질Blue-Oh MeloNo ratings yet
- Task Based Language Teaching (복구됨)Document4 pagesTask Based Language Teaching (복구됨)이서현No ratings yet
- 문법1단원 (002-047) UDocument46 pages문법1단원 (002-047) Usparta1112No ratings yet
- 인쇄Document10 pages인쇄Javkhlantugs GantumurNo ratings yet
- TBP 6Document4 pagesTBP 6이서현No ratings yet
- 윤소영, 김은경 (2016) - 짧은만화대화 중재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초등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3 (1), 69-89Document21 pages윤소영, 김은경 (2016) - 짧은만화대화 중재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초등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3 (1), 69-89고이경ig kNo ratings yet
- 6 PDFDocument188 pages6 PDFNyan KyiNo ratings yet
- 맞춤한국어 5Document164 pages맞춤한국어 5조曹No ratings yet
- 한국어 어휘 어떻게 가르칠까-제5장 응웬티히엔Document23 pages한국어 어휘 어떻게 가르칠까-제5장 응웬티히엔Kim Chi Phan ThịNo ratings yet
- 영어교수법-10주차 강의교안Document116 pages영어교수법-10주차 강의교안박하향No ratings yet
- 영어교수법-13주차 강의교안Document105 pages영어교수법-13주차 강의교안박하향No ratings yet
- Material PTKR 2Document79 pagesMaterial PTKR 2Bruna M Sette100% (1)
- 이종희, 김은경 (2012) - 연재만화대화 중재가 고기능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 (3), 225-258.Document34 pages이종희, 김은경 (2012) - 연재만화대화 중재가 고기능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 (3), 225-258.고이경ig kNo ratings yet
- 11. 연구 논문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Document18 pages11. 연구 논문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snow ladyNo ratings yet
- 영어교수법-11주차 강의교안Document97 pages영어교수법-11주차 강의교안박하향No ratings yet
- 맞춤한국어 1Document152 pages맞춤한국어 1조曹No ratings yet
- Kyobo: Book CentreDocument23 pagesKyobo: Book Centre맹수야.No ratings yet
- 국어교과서 - 부속 (교) .indd 1 2018-01-16 오전 9:42:44Document61 pages국어교과서 - 부속 (교) .indd 1 2018-01-16 오전 9:42:44sidsidsudsidsidNo ratings yet
- 고1 국어 신사고 교사용 1단원Document61 pages고1 국어 신사고 교사용 1단원hjus0810No ratings yet
- 신사고 국어 고1 1단원Document61 pages신사고 국어 고1 1단원sominjakNo ratings yet
- 신사고 국어 고1 4단원Document38 pages신사고 국어 고1 4단원sominjakNo ratings yet
- 발표 자료 (한국어교재론)Document2 pages발표 자료 (한국어교재론)kim soyuNo ratings yet
- 맞춤한국어 3Document156 pages맞춤한국어 3조曹No ratings yet
- Material PTKR 4Document79 pagesMaterial PTKR 4Bruna M SetteNo ratings yet
- 감각통합과 아동 시지각 및 청각-언어장애Document4 pages감각통합과 아동 시지각 및 청각-언어장애송지수No ratings yet
- 맞춤한국어3 교사용지침서Document152 pages맞춤한국어3 교사용지침서kkumbonalda100% (1)
- 3 .Document152 pages3 .Nyan KyiNo ratings yet
- Lý Thuyết TiếngDocument8 pagesLý Thuyết TiếngNguyễn Thị NhungNo ratings yet
- 10쪽 1단원 교과서 본문Document40 pages10쪽 1단원 교과서 본문jiwooson0613No ratings yet
- 2015Document220 pages2015xdtytt484cNo ratings yet
- 천재교육 - 고등교과서 - 언어와매체 - 민현식 (15개정) - 교과서 본문Document74 pages천재교육 - 고등교과서 - 언어와매체 - 민현식 (15개정) - 교과서 본문ksa33-22-10225No ratings yet
- Manual CoreeanaDocument128 pagesManual CoreeanaRubert Cimbala100% (2)
- 맞춤한국어2 교사용지침서Document158 pages맞춤한국어2 교사용지침서kkumbonaldaNo ratings yet
- Korean JournalDocument188 pagesKorean JournalyhnujmikyhnujmikNo ratings yet
- 최효희 (2016) 연재만화대화가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논총 Vol.32 No.1Document33 pages최효희 (2016) 연재만화대화가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논총 Vol.32 No.1고이경ig kNo ratings yet
- 바디 랭귀지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디랭귀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From Everand바디 랭귀지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디랭귀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No ratings yet
- Learning Log 12Document3 pagesLearning Log 12BBB YNo ratings yet
- Learning Log 5Document4 pagesLearning Log 5BBB YNo ratings yet
- 윤별 Learning Log 4Document4 pages윤별 Learning Log 4BBB YNo ratings yet
- 윤별 Learning Log 2Document5 pages윤별 Learning Log 2BBB YNo rating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