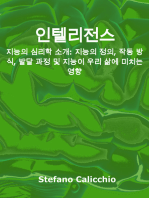Professional Documents
Culture Documents
데이비드 흄
데이비드 흄
Uploaded by
o oCopyright
Available Formats
Share this document
Did you find this document useful?
Is this content inappropriate?
Report this DocumentCopyright:
Available Formats
데이비드 흄
데이비드 흄
Uploaded by
o oCopyright:
Available Formats
데이비드 흄은 제한적 공감이 확장적 공감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한적 공감이란 나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대상에 대한 공감으로 편파성을
갖지만, 확장적 공감은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판단능력을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경험자료들을 일종의 빅데이터로 활용해 타인의 상황과 견주어 보며 반성과 상상력을 통해 확장적
공감을 하고 도덕행위에 대한 보편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경험을 쌓고 공감능력을
길러나가며 폭넓은 사고를 통해 순간적 판단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창안한 개념인 ‘공동체의식’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이 전체의 일부라는
의식이다. 그는 공동체의식은 곧 정신건강의 척도라 주장했다. 타인과 협동하는 능력, 협조하는 용기,
인간 동등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 연대감, 공감능력이 곧 공동체의식을 이루는 요소이다. 인간 개인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열등감을 가진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작게는
가정, 지역사회 크게는 인류, 우주로까지 공동체의 개념과 범주를 만들고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며
열등감을 극복하고 발전한다.
여기서 열등감이란 알프레드 아들러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존재의 보편적 현상이자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신체적,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속에서 고차원적 문화를 창조한다. 미는 추에 대한 보상이고 종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함,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시키고 결국 열등감은 인류의 총체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아들러는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보상의 방향이 잘못되면 인간은 사적 논리의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 태도는 타인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 지배욕구를 부르며 이는 공동체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며
재교육을 통해 보상의 방향성을 바꿔나가야 한다.
여기서 아들러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이 가장
처음 공동체의식을 익힐 수 있는 집단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평가적 행위인 칭찬보다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모는 자식이 앞으로도 겪을 열등감에 대한 극복의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위와 원칙을 앞세워 자식을 복종시키기보다 인간 동등성을 가정 내에서
실천하며 질문의 기회를 주고 협동능력을 키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들러의 입장에서 부모가
가정교육에 있어 신경써야할 점은 자식이 지닌 공동체의식의 씨앗을 안전한 가정의 보호 아래
온전히 성장토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You might also like
- 서양 학포 (ㅎㅈ쌤)Document101 pages서양 학포 (ㅎㅈ쌤)남성정훈100% (1)
- 에릭슨 사회발달이론 정리 2차본Document7 pages에릭슨 사회발달이론 정리 2차본정선영No ratings yet
- 미치가 타이핑-13Document47 pages미치가 타이핑-13소진우No ratings yet
- 1교양인과 좋은 인성Document28 pages1교양인과 좋은 인성유민용No ratings yet
- Suteuk (Ch1 4)Document32 pagesSuteuk (Ch1 4)bjh6941No ratings yet
- 대인동기 대인신념Document36 pages대인동기 대인신념한동호No ratings yet
- Jcos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윤리와 사상Document60 pagesJcos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윤리와 사상이상윤No ratings yet
-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권2호, 2015, p. 27-42Document16 pages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권2호, 2015, p. 27-42Heejin Tina KimNo ratings yet
- °øÁ÷À ®18. 9. 21 3°Document44 pages°øÁ÷À ®18. 9. 21 3°Yona LuNo ratings yet
- 자기관리형생활평점제를 가꾸고Document2 pages자기관리형생활평점제를 가꾸고justinseo007No ratings yet
- 6월 모평 문제Document5 pages6월 모평 문제9n5628d9h2No ratings yet
- 나의 인간관계 분석 보고서Document3 pages나의 인간관계 분석 보고서zonini2001No ratings yet
- 최종점검 암기노트Document68 pages최종점검 암기노트Lee SewanNo ratings yet
- 수특 독해연습 한줄해석 01강 06강 (0217) PDFDocument71 pages수특 독해연습 한줄해석 01강 06강 (0217) PDFMYEONG GIL JiNo ratings yet
- EBS - 2024학년도 - 수능특강 - 사탐 - 사회문화 - 본문 (교사용) 2Document1 pageEBS - 2024학년도 - 수능특강 - 사탐 - 사회문화 - 본문 (교사용) 2담희No ratings yet
- 인텔리전스: 지능의 심리학 소개: 지능의 정의, 작동 방식, 발달 과정 및 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From Everand인텔리전스: 지능의 심리학 소개: 지능의 정의, 작동 방식, 발달 과정 및 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No ratings yet
- 밀레니엄 세대의 인격 교육의 중요성Document7 pages밀레니엄 세대의 인격 교육의 중요성tria oktavianiNo ratings yet
- (11장) 성격Document38 pages(11장) 성격김민혁No ratings yet
-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 awaken-the-giant-within - summary - 한국어 요약본Document9 pages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 awaken-the-giant-within - summary - 한국어 요약본andrewubfNo ratings yet
- PosterDocument5 pagesPosterNguyễn Trang NhungNo ratings yet
- 헷갈리는 이론 다잡기Document2 pages헷갈리는 이론 다잡기tngus723No ratings yet
- 7 (4.17)Document38 pages7 (4.17)이예진No ratings yet
- 가족상담및치료Document212 pages가족상담및치료ysp.madi05No ratings yet
- 집단상담 논문 PDFDocument6 pages집단상담 논문 PDFEunJung LeeNo ratings yet
- 집단상담 논문Document7 pages집단상담 논문EunJung LeeNo ratings yet
- 집단상담 논문 과제 - 이은정 2021200700Document6 pages집단상담 논문 과제 - 이은정 2021200700EunJung LeeNo ratings yet
- 집단상담 논문Document7 pages집단상담 논문EunJung LeeNo ratings yet
- SumaryDocument2 pagesSumary김민주No ratings yet
- 신뢰서클Document12 pages신뢰서클hyemin kimNo ratings yet
- 찐 대본Document7 pages찐 대본유자레몬No ratings yet
- 123 e 3 e 25 B 27 F 46 F 89 AdeDocument7 pages123 e 3 e 25 B 27 F 46 F 89 Adeapi-425432844No ratings yet
- 2022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3급 1교시 시험지Document22 pages2022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3급 1교시 시험지Rebecca LeeNo ratings yet
- 한국 성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Document42 pages한국 성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Dahai parkNo ratings yet
- 모의고사Document4 pages모의고사안서경No ratings yet
- 7장 세부적인 심리도식의 치료방략 (발표ppt)Document112 pages7장 세부적인 심리도식의 치료방략 (발표ppt)이정진No ratings yet
- 한국인의 사회심리 - 관계주의Document22 pages한국인의 사회심리 - 관계주의카스테라No ratings yet
- 융의 분석 심리학(s)Document4 pages융의 분석 심리학(s)Yiheon Shin100% (1)
- 교육철학 및 교육사Document6 pages교육철학 및 교육사고요한No ratings yet
- 12. 교육철학 3Document14 pages12. 교육철학 3꺄아No ratings yet
- 20suneung23 42 1Document4 pages20suneung23 42 1YongBeom ParkNo ratings yet
- 2023Document4 pages2023seoms1025No ratings yet
- 고전읽기 점검문제+니체2최종Document2 pages고전읽기 점검문제+니체2최종Kwon MichaelNo ratings yet
- 논술 강의자료1Document13 pages논술 강의자료1김민성No ratings yet
- (2019년 9월 모평) 고3 생활과 윤리Document5 pages(2019년 9월 모평) 고3 생활과 윤리서보윤No ratings yet
- (2021년 기출) 선사고등학교 (서울 강동구) 3-1 중간 생활과 윤리 족보 (q) 2Document9 pages(2021년 기출) 선사고등학교 (서울 강동구) 3-1 중간 생활과 윤리 족보 (q) 25j4g2xfqq7No ratings yet
-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Document92 pages(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htwblueNo ratings yet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Document4 pages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장아영No ratings yet
- 주차 인성과 핵심역량 3 - dimaDocument2 pages주차 인성과 핵심역량 3 - dimamoon051203No ratings yet
- 3장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 201992620420Document15 pages3장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 201992620420제밍No ratings yet
- (2019년 7월 학평) 고3 생활과 윤리Document5 pages(2019년 7월 학평) 고3 생활과 윤리서보윤No ratings yet